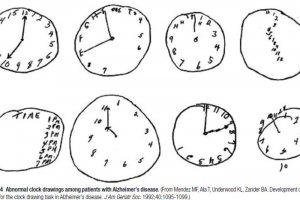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그 가운데 하나가 ‘택배’라는 말이었다. 처음에 소리만 듣고는 무슨 뜻인 줄 몰랐다. 앞뒤 문맥에 맞춰 생각해보고 택배(宅配)라는 한자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쿠하이’라는 일본어 단어가 떠올랐다.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들여와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꾼 것 같았다. 그래도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이뿐이 아니었다.
‘착불’이라는 단어도 처음엔 몹시 생소했다. 문맥 없이 이 단어를 처음 보고는 그 뜻을 선뜻 알 수 없었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주문을 하다가 그 단어를 다시 접했다.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았는데, 검색을 하고서야 그것이 물건을 받은 후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임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못내 씁쓸했다. 일본어 ‘차쿠바라이’가 바로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한자로 표기하면 착불(着拂)이니, 이 또한 일본 단어를 들여와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꾼 게 분명해 보였다.
귀국 초기에 어떤 백화점 식품코너에서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이것도 1993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못 보던 단어이기에 낯설었다. 가까이 다가가 이리저리 둘러보고서야 그게 냉동하지 않은 육류나 생선 따위를 뜻하는 단어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슬퍼졌다. 일본어 “나마모노”가 즉각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자로 쓰면 생물(生物)로, 역시 일본 한자어를 그대로 들여와 그 발음만 “생물”로 바꾼 게 뻔했다.
같은 백화점에서 ‘유럽향‘이라는 광고판도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또한 일본말 어원임을 순간적으로 감지했다. ‘요로파무케’라고 할 때 요로파는 유럽을 가리키고, 뒤에 붙은 ‘무케’의 한자가 바로 한국어 발음으로 향(向)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들여와 외래어로 쓰는 일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전근대 한국어에 중국식 한자어가 압도적인 것이나, 근대 한국어에 일본식 단어가 넘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상호관계가 그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와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꿔 쓰는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외국의 어떤 제도나 형식을 수입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어 개념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이 땅에 일본식 한자어를 따발총 갈기듯 퍼부어 대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식민지 시절에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21세기에 접어든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 식민지의 향수를 못 잊어서인가.
일전에 중국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다가 한국인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런데 일본은 소리조차 내지 않는데도 생각 없는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한반도를 향한 ‘언어의 서북공정’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다. 그나마 한글날이 부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날을 맞을 때마다 마음은 썩 편치 않다.
2014-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