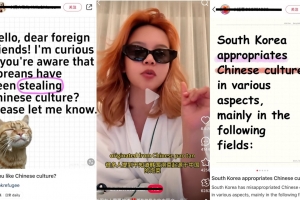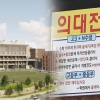지난달 드러난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은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했다. 그런데 들끓었던 공분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를 당혹하게 한 일이 생겼다. 경찰청이 사건 직후 확인했더니 염전 등지에서 발견된 장애인 49명 중 10명이 자신이 일했던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 만남을 원하지 않거나, 그곳에서 나와도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유란다. ‘염전 노예’ 사건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게 한다.
이들은 왜 염전을 등지지 못할까. 3급 지적장애인 박모(40대)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일과성 분노와 당국의 단속은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가 8년 전인 2006년 ‘노예사건’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반 년 만에 염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가 먼저 염전 주인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최소한으로 기대했던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할 일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자활 의지도 있었지만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 60.4%보다 훨씬 낮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지만 “밥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의 말이 귓전을 세게 때린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착취 사건이 터질 때면 그들의 열악한 노동 여건에 분노한다. 착취한 고용주에 대한 질책만 늘어놓는 데 머물고 만다. 그 관심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 버리고 잊고 지낸다. 악덕 고용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노와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그토록 외쳐대는 복지도 이런 잘못된 구조를 고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말이 어눌하고 행동은 느리지만 이들에게 가능한 단순한 노동은 적지 않다. 이런 고용체계를 갖추면 이들에게 맞는 임금체계도 생기게 된다. 이미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들의 성공담도 많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번만은 장애인의 노동 착취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를 바란다.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만의 생산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장애인과 수익을 나누는 방안은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터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염전노예’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근원적 처방이다.
이들은 왜 염전을 등지지 못할까. 3급 지적장애인 박모(40대)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일과성 분노와 당국의 단속은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가 8년 전인 2006년 ‘노예사건’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반 년 만에 염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가 먼저 염전 주인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최소한으로 기대했던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할 일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자활 의지도 있었지만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 60.4%보다 훨씬 낮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지만 “밥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의 말이 귓전을 세게 때린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착취 사건이 터질 때면 그들의 열악한 노동 여건에 분노한다. 착취한 고용주에 대한 질책만 늘어놓는 데 머물고 만다. 그 관심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 버리고 잊고 지낸다. 악덕 고용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노와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그토록 외쳐대는 복지도 이런 잘못된 구조를 고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말이 어눌하고 행동은 느리지만 이들에게 가능한 단순한 노동은 적지 않다. 이런 고용체계를 갖추면 이들에게 맞는 임금체계도 생기게 된다. 이미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들의 성공담도 많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번만은 장애인의 노동 착취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를 바란다.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만의 생산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장애인과 수익을 나누는 방안은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터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염전노예’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근원적 처방이다.
2014-03-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