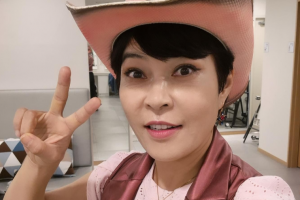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기승전, 코로나…’. 가정에서든, 친구지간이든, 영세 영업자든 모든 사안이 코로나로 귀결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지 만 2년. 우리는 확진자, 의심환자, 부스터샷, 위중증 환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생경한 바이러스의 부산물과 맞서야 했다. 정치, 경제 같은 거대 담론은 둘째치고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코로나의 위세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 여파는 없이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거칠게 와닿는다. 방역 강화로 발길이 뜸해진 영세 사업장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방역 우선주의에 사람의 자리를 내어 준 투박하고 거친 장면들이다.
아메리카 초기 이주민들은 거칠고 낯선 황야를 두 발로 밟고 버텨 가며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갔다. 그처럼 바이러스가 아무리 거센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며 그 과정이어야 한다.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당당한 공동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여정은 공동체 일원 누구든 삶의 터전을 지켜 내겠다는 의지와 바이러스 앞에서 기본권을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자긍심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은 방역 지상주의에 묻혀 있던 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의지를 새삼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단체 급식에 의존하던 결식 아동들, 디지털에서 소외된 이웃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힘든 짐을 안고 사는 한부모 가정, 시설 폐쇄로 갈 곳을 잃어버린 어르신들, 매출 급감으로 끝내 지탱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자영업자들…. 바이러스는 추궁하듯 위세를 떨치며 우리 공동체의 약한 고리,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찬바람이 불면 시린 곳이 더 시린 법이다. 방역패스를 비롯한 일련의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이 방역 논리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해야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역패스 제도를 공중집합시설에 일괄 적용할 게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핀셋 적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역에서는 무엇보다 신속성과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방역 정책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되면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마련할 방역 정책이 개개인의 기본권을 비롯한 상위 법률이나 인권 문제와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훑어보는 점검 체계를 쉼없이 가동해야 한다. 방역의 영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인권단체들의 건의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방역인권점검반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거듭 돌아볼 때다.
언제 사그라들지 예단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맞서 우리는 끝내 존엄한 권리를 지켜 내야 한다. ‘페스트’(알베르 카뮈 作)에 지친 골목길에서 결국엔 사람의 땅을 되찾았듯이….
2022-01-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