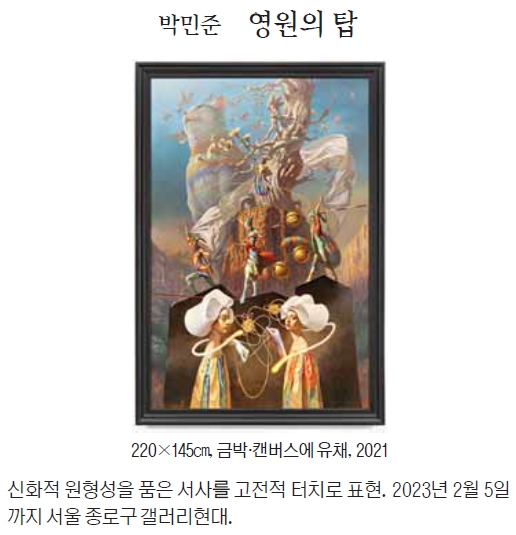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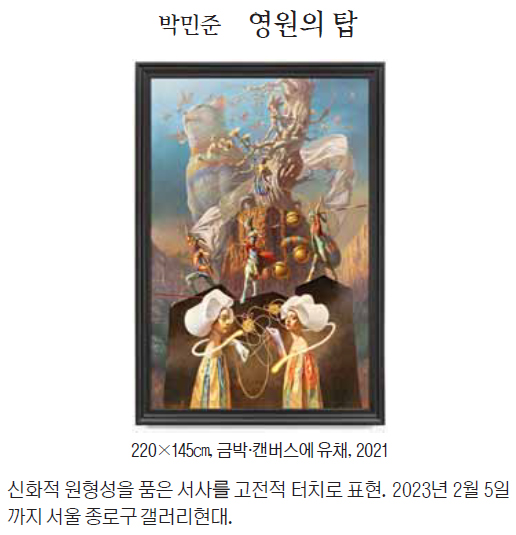
움켜잡는 갈고리처럼 세상의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다.
내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걸린다.
피로한 분개, 타오르는 체념.
사형집행인들이 돌을 준비하고, 신이 모래 속에 글을 쓴다.
조용한 방.
달빛 속에 가구들이 날아갈 듯 서 있다.
천천히 나 자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텅 빈 갑옷의 숲을 통하여.
한 해가 저문다. 일생이 저무는 때를 생각한다. 갈고리를 움켜쥐고 ‘바닥을 질질 끌며’ 살았다. 거리를, 광장을, 골목을 걸었다.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걸’리는 ‘갈고리’를 들고 살아야만 했던가! 문득 소스라친다. 나의 이 작다고 여겨지는 욕망마저 혹 ‘갈고리’는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죽음을 앞둔 ‘조용한 방’ 사 모았던 값비싼 치장들(가구들) 또한 이미 자기 자리가 아닌 상태. ‘날아갈 듯 서 있’는 방이다. ‘갑옷’과 같았던 생애를 떠올린다. 이 얼마나 허망한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겁고 갑갑한 장식의 옷, 전장의 옷이란 말인가. 그 터널을 지나 자기 자신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비로소 자유다.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 ‘체념’이 타오르고 있어서. ‘갈고리’를 쥔 손을 볼 수 있어서.
세모다. 악몽과 같은 어스름의 시간. 횡행하는 갈고리들의 세모다. 다 먹어치운 태양이 떠오르면 좋으련만.
장석남 시인
2022-12-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