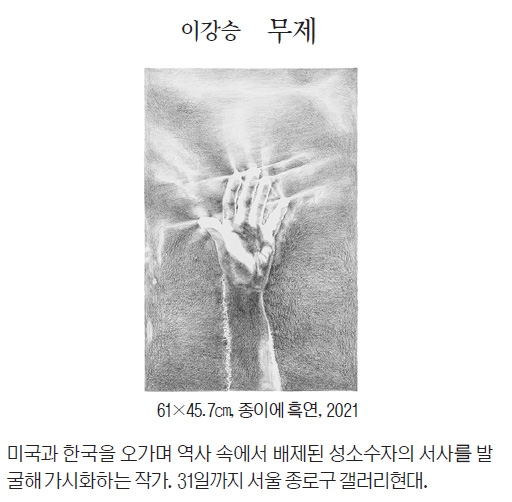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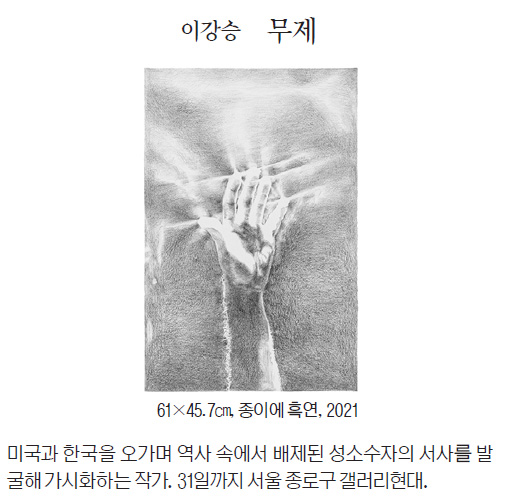
엄마는 초등학교 오학년 막냇동생을 뼈다귀 사오라 보냈다
엄마도 나도 기억 못 하는 오래전 이야기
백사십 센티도 안 되는 아이가 노란 양동이 들고
뼈 사러 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몇 번을 휘청거려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
우리에겐 저마다 어떤 병이 있고
대신 문병 가는 이웃이 있고
대신 병 치르는 사람이 있고
대신 밥 차리는 여인이 있고
대신 뼈를 사 오는 가녀린 아이가 있다
나는 누구의 대신일까
누가 나 대신 황야를 걸어 노을 속으로 심부름 갔을까
누군가 대신 들고 온 양동이 속엔
핏물 머금은 뼈다귀들이 울음도 없이
세상에, 심부름 중에 뼈 심부름이 있군요. 양동이 하나를 들고 시장 모퉁이 정육점에 가 뼈를 사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국거리에 이만큼 진지한 맛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140㎝도 안 되는 막냇동생에게 뼈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김안녕 시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축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을 잠시 합니다. 살면서 어머니는 산전수전 다 겪었을 테지요. 양동이 안 핏물 머금은 뼈는 핍진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네 삶의 은유가 아닐는지요? 힘든 시절을 겪을 적마다 막내는 뼈 사러 가던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겠는지요. 우리에겐 저마다 어떤 병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병을 이해하고 따뜻이 감싸 안아 줄 때 세상은 좀더 살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2021-12-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