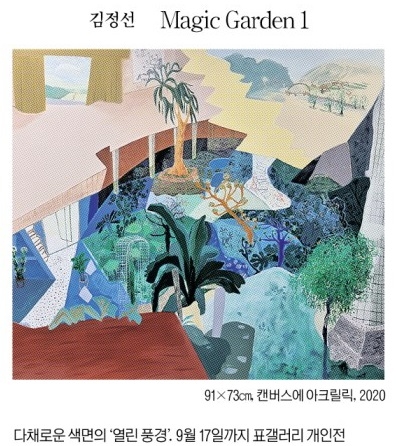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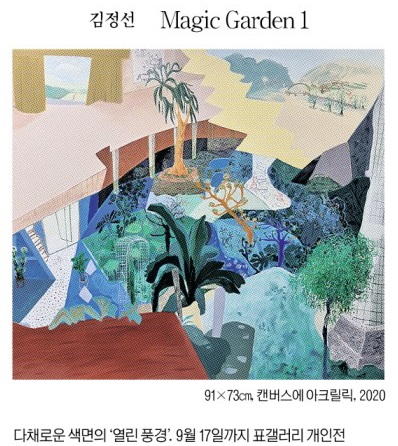
어느 찌는 듯 더웁던 날 그대와 나 함께
손목 맞잡고 책이나 한 장 읽을까
수림 속 깊이 들어갔더니
틈 잘 타는 햇발, 나뭇잎을 세이어
앉을 곳을 쪽박벌레 등같이
아룽아룽 흔들리는 무늬 놓아
그대의 마음 내 마음 함께 아룽거려
열없어 보려던 책 보지도 못하고
뱀몸 같은 나무에 기대 있었지
읽는 내내 사랑스런 마음 지울 수 없다. 연인은 손목 잡고 수림 속으로 들어간다. “날이 참 덥구려, 우리 숲속에 들어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읽으며 더위를 피합시다.” 이 시가 쓰여진 1926년 무렵엔 백석도 지용도 동주도 릴케를 좋아했으니 이 유혹은 세련되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좋아하는 남정네가 숲 향기 맡으며 릴케를 읽자는데 “싫소”라고 답하는 조선 처자는 없을 것이다. 숲속에서 꼭 책 읽기만 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랴? 쪽박벌레 등 같은 햇발이 어룽어룽 ?아다니며 방해를 하네. 둘의 마음도 함께 어룽거려 릴케의 시는 읽히지 않고 뱀몸 같은 나무에 등 기대고 서 있으니, 연인이여 심란해하지 말고 산사나무 꽃 같은 입술 바람인 듯 맞추시게나.
곽재구 시인
2021-08-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