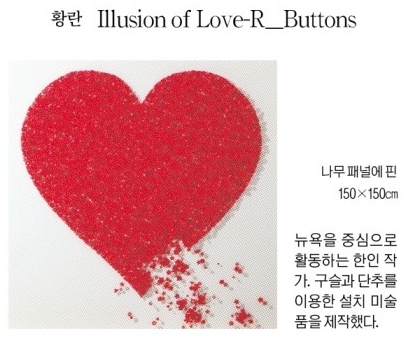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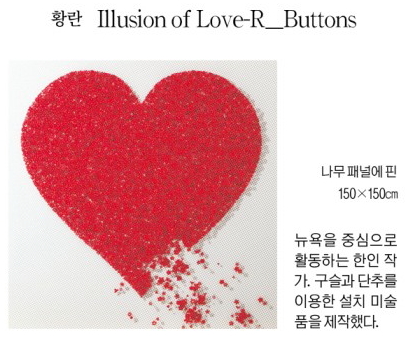
톱밥 난로 투둑투둑 뜨겁던 교회
마루 틈은 할머니 집사님 흘린 눈물로
까만 때가 스며 있던 교회
그 눈물들이 양초 속에서 매끄럽게 윤이 나던
들판 가운데 작은 교회
종루에 매어진 끈을 잡아당기면
종소리는 겨울 투명한 들녘을 가로질러
나락 벤 자리를 더듬다가
장독대 간장독을 지나
초종, 재종으로 성도들을 불렀지
성탄절 새벽송을 부를 때면
첫사랑 손 스침의 감격이
펼친 찬송가 위에
구주 예수 탄생처럼 명료하던 곳
주일을 못 지키는 일이 있어도
힘든 친구 따뜻하게 받아 안던 교회
끝내 기울어져 전나무를 잘라 받쳐 쓰다가
결국 사라지고 없는 교회
우리들 마음 그 끝에 세워진
저 들판 작은 교회
-
바닷가 길을 떠돌다 컨테이너 두세 칸 크기의 작은 교회를 만나면 반갑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장의자에도 앉아 보고 잠시 묵상도 한다. 벽화 속 눈매 서글한 이에게 잘 지내시지요? 안부도 전한다. 줄에 묶인 종루의 종도 쳐 본다. 구조라 바닷가에서 작은 교회를 본 적 있다. 교회의 목사님이 빛바랜 흰 셔츠를 입고 상추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어느 봄 신입생들이 들어와 대면식을 하는데 한 학생이 구조라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녀석에게 그곳의 작은 교회와 상추 캐던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우리 아빠예요” 했다. 이번 성탄절에 첫사랑 손 스침의 떨림이 남아 있는 들판의 작은 교회에 가고 싶다.
곽재구 시인
2018-12-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