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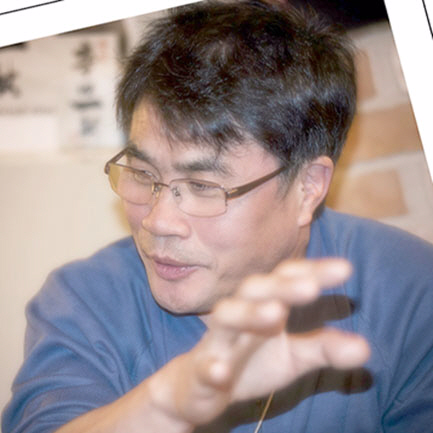
조영학 번역가
평론가 표정훈은 페이스북에 “번역이 곧 문화이자 문명”이라고 적었다. “번역서가 왜 중요하고 더 많이 제대로 번역되어야 하는가 새삼 굳이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지식의 수용과 심화, 언어의 지평과 가능성 확장, 세계 인식의 범위 확대, 인간 이해의 다양성 확충, 지식, 언어, 세계, 인간. 바꿔 말하면 번역가들은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 있다. 문명/문화는 곧 번역이고, 번역이 곧 문명/문화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번역가들이 출판 번역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부와 명예까지는 아니어도 명분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르네상스(Renaissance)는 ‘재생’(rebirth)을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다. 지적ㆍ문화적 체계가 쇠퇴했던 중세기에 고전시대의 텍스트와 철학을 “다시 살린다”는 뜻이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번역’이었다. 번역은 모든 문화ㆍ문명의 통로이자 출발점이다.
얼마 전 채용정보 포털회사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향후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톱 10’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랑스럽게도(?) 번역가가 당당히 1위에 올랐다(무려 31%). 이유는? “인공지능(AI) 번역기의 발전이 눈부셔서.” 말미에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문학 번역의 경우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발을 뺐지만 번역가를 이미 ‘멸종 위기 직업군’으로 낙인을 찍은 후였다.
사실 번역가들에게 AI 번역기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AI 번역이 인간의 언어 능력을 대신한다는 상상 자체로도 여전히 비현실적이지만 AI가 대업을 떠안기 전에 번역가가 멸종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AI를 향한 환상은 번역가를 10년 이내에 멸종할 직업군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번역 자체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격이다. 1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을 누가 선택한다는 말인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번역가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까지 번역을 꺼린다는 데 있다. 이따금 번역가들에게 작업 의뢰를 할라치면 A는 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취직을 하고, B는 출판사에 입사하고, C는 영어 과외를 하느라 번역할 시간이 없었다. 번역이 곧 “문명이자 문화”라지만 거창한 명분은 멀고 당장의 먹거리는 코앞이다. 번역의 멸종은 이미 진행형이다.
지난주 외주노동자 복지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한 적이 있다. 그중 “번역가에게 실업수당을 지불하려면 번역이 노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껏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실현된다면 일감이 떨어진 번역가의 경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내가 보기엔 번역가의 현주소가 딱 여기다. 정부 예산의 천덕꾸러기. 번역의 쇠퇴가 오히려 AI 번역의 도래를 막고 문화의 공백을 부르리라는 그간의 하소연은 어디에도 없고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주노동자의 신분만 남은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입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신분으로 ‘문화 전달자’로서의 명분을 외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노릇이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멸종 위기 직업을 선택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싶지는 않다. 다만 표정훈 작가의 말마따나 “번역이 없으면 문화도 문명도 없다.” 그것마저 AI 번역기가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기다릴 참인가?
2019-11-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