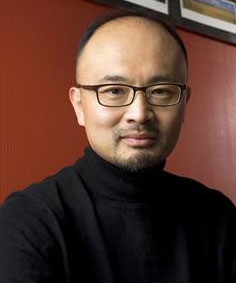

황두진 건축가
내용 중에 도시 다양성을 위한 조건으로 ‘오래된 건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저자는 ‘도시에는 반드시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단호한 주장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도시미관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오래된 건물은 새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한꺼번에 지어진 동네’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는다. 한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는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내구성의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애초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면 철거 후 신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건물은 부지기수다. 그다음에는 밀도의 문제가 있다. 아마도 한국의 도시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줄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서울의 강남만 해도 원래는 강북의 베드타운으로서, 큰길가를 제외하고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계획됐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소위 용적률이 낮고 층고도 부족하며 지하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밀도를 요구하는 현대 도시에서 그 운명을 기약하기 어렵다. 흔히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하는 사례로 유럽을 인용하곤 하는데, 자동차 시대의 도래 이전에 충분히 높은 평균 용적률에 여유 있는 층고로 지어 놓은 건물이 많은 그들의 상황을 한국과 동등 비교하기는 어렵다. 온갖 논의와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자리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모든 문제를 통과해도 여전히 비용의 문제가 남는다. 흔히 건물을 고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된다고 하지만 철거, 구조 변경 및 보강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건물에 대한 정서적 애착, 혹은 역사 보존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오래된 건물의 운명은 결코 밝지 않다. 사실 제이컵스의 책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며 기존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진심이건 지적 허영이건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즐겨 인용하지만, 실제의 도시는 이와 또 다른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 구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지 한구석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정서적 가치는 충만한 벽돌조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의 기억과 서사를 유지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뢰인과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상해야 하는 입장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한편으로는 제이컵스의 교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와 건축의 엄연한 현실 사이의 고뇌를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도시에서 오래된 건물을 대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2021-10-0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