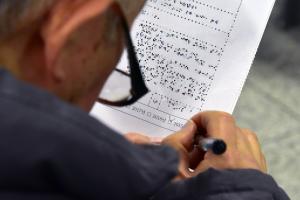[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伊·佛·美 와인 풍미 머금은 ‘그레인지’

팬폴즈 제공

호주의 국보급 와인으로 불리는 팬폴즈 와이너리의 그래인지 와인. 호주 와인의 역사는 그래인지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팬폴즈 제공
팬폴즈 제공
호주 와인도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와인생산량의 4%를 생산하는 호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큰 와인 수출국입니다. 2000개 이상의 와이너리들은 최첨단 양조기술을 앞세워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와인 천국’이 된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는 주정을 강화해 알코올 도수가 높고 달콤한 포트 와인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금양인터내셔널 제공

에밀리 스켁텐본 팬폴즈 와이너리 브랜드 앰버서더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호주 와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제공
금양인터내셔널 제공
그랬던 호주에서 ‘파리의 심판’급 와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애들레이드 인근 바로사에 위치한 펜폴즈 와이너리의 ‘그레인지’입니다. 1844년 영국인 의사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드가 호주로 이주하면서 설립한 펜폴즈는 원래 치료용 포트와인을 만들던 와이너리였습니다. 1940년대 이곳 수석 양조사로 일하던 막스 슈버츠는 “유럽의 선진화된 포트와인을 배우고 오라”는 특명을 받고 프랑스 보르도로 연수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보르도의 드라이한 레드와인에 오히려 감명을 받습니다. 돌아온 슈버츠는 호주 남부에서 가장 질이 좋은 쉬라즈 품종으로 드리이한 레드와인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죠.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와인 숙성을 위해 프랑스에 오크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프랑스 와인업계 사람들은 “멀리 있는 듣보잡 대륙에 무슨 좋은 오크통을 주느냐”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슈버츠는 하는 수 없이 미국 오크통을 구해 와인을 완성합니다.
1953년 세상에 나온 그래인지는 처음에는 포트 와인만 마실 줄 알던 호주인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하던 거나 계속하라”고 했지만 슈버츠는 몰래 그레인지를 만들 정도로 열정을 쏟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와인은 차츰 입소문 났고 어느새 호주의 와이너리들은 그래인지를 따라서 드라이한 레드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5년 1990년 빈티지가 와인 스펙테이터에 의해 ‘세기의 와인’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은 그래인지를 수집할 가치가 있는 와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호주도 뛰어난 레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단박에 보여준 셈이죠.
그레인지의 특성은 와인 한잔에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와인의 특성이 모두 드러나는 복합적인 풍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프랑스 사람들이 슈버츠에게 순순히 오크통을 줬더라면, 이 와인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macduck@seoul.co.kr
2019-04-2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