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과지성사 제공

여섯 번째 시집 ‘빛과 이름’을 펴낸 성기완 시인.
문학과지성사 제공
문학과지성사 제공
1994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로 등단한 시인은 자유분방하고 감각적인 시어, 시와 음악의 결합 등의 실험을 꾀하며 “시적 무정부주의자”(김현문학패)로 문단의 경계를 넓혀 왔다.
이번 시집에는 작고한 지 10년이 된 아버지 고 성찬경(1930~2013) 시인을 위시해 시인이 떠나오고 떠나보낸 존재들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여느 때보다 짙게 배어 있다. 특히 아버지의 49재에 바친 시 ‘빛’에서 시인은 ‘빛의 스밈’을 통해 아버지의 영혼을 느끼는 동시의 그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고야 만다.
‘더 큰 신비의 이불인 빛은/존재의 어느 덩어리/어떤 모양/허연 도포 자락의 기운을 머금은 하늘이/하품을 하듯 빛을 쏟아내면/이승은 들뜨면서 안타까워져요//아버지는 그렇게 수박 빛깔 레몬 빛깔이 섞인/눈부신 빛의 얼굴로/허공을 건너 들어오셨어요’(빛)
음악 활동과 시쓰기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온 시인답게 그의 시집 목차에 나열된 시 제목들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음악의 멜로디로 그득하다. ‘모퉁이 카페 소네트’, ‘소희 찬가’, ‘게으른 기타리스트의 발라드’, ‘복숭아 소네트-슈 환상곡’…. 그의 시 세계가 음악과 노래의 자장 안에 어우러져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황유원 시인은 해설에서 “이번 시집은 성기완이 낸 그 어떤 시집보다 원초적인 ‘노래’에 가깝다. 그가 불러주는 노래들은, 누군가는 여전히 난해하고 실험적으로 느끼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겹다”며 “시인이 부르는 노래들의 후렴을 이루는 핵심은 ‘사랑’”이라고 짚었다.
부재에 대한 감각이 더 커진 만큼, 사랑에 대한 감도는 더 애틋해졌다. 모든 존재를 품는 지구의 온화한 비트를 느끼는 시인의 감각은 여전히 젊고 생생하다.
‘지구는 드넓은 출렁임/하지만 적당히 붙들어준다네/아니 아니 BOOM BOOM/실은 물방울 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지/모두에게 발찌를 채워주고/하나도 아프진 않네/지구는 부드러운 손바닥/모든 비트는 붐붐붐/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오지’(붐붐 중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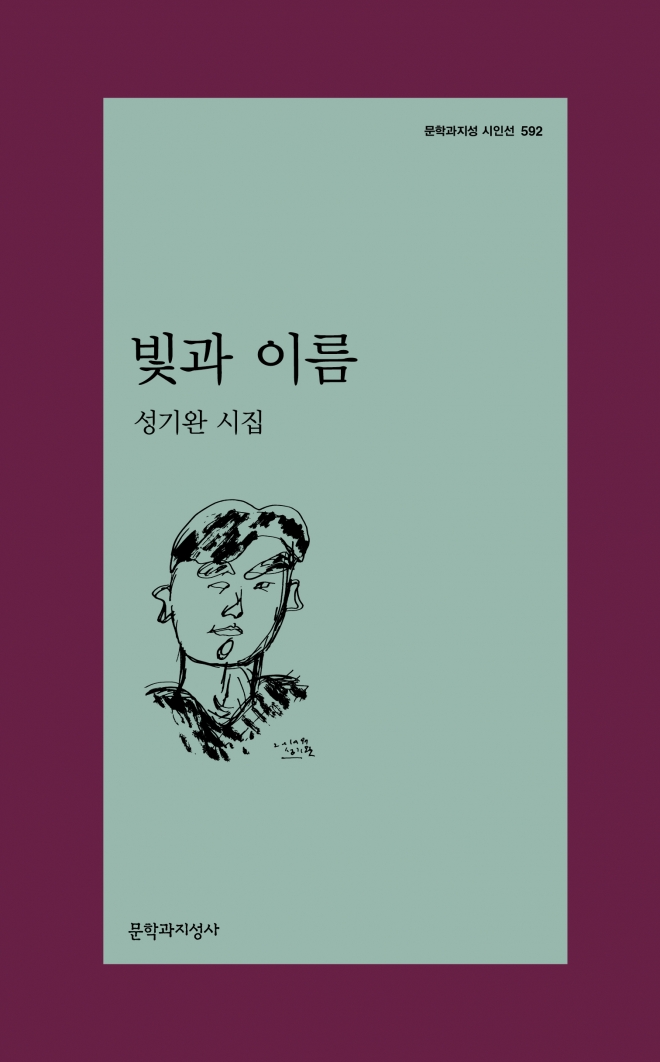
문학과지성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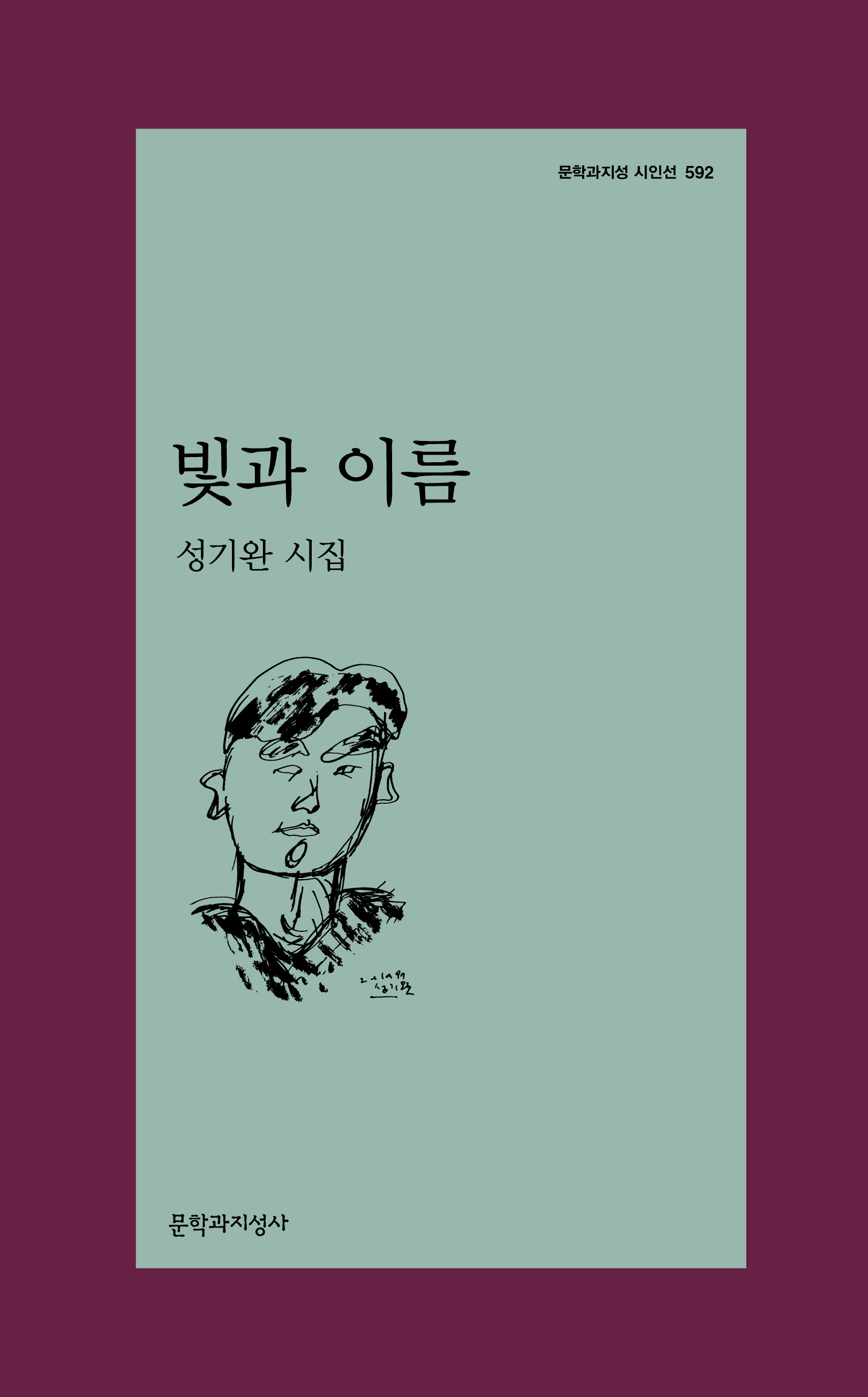
최근 문학과지성 시인선으로 펴나온 성기완 시인의 시집 ‘빛과 이름’.
문학과지성사 제공
문학과지성사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