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을 강요하는 일본
이케다 기요히코 지음/김준 옮김
소미미디어/216쪽/1만 4800원

위키피디아

이케다 기요히코 교수는 저서 ‘자숙을 강요하는 일본’에서 혐한을 일삼는 일본인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며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받은 탓에 주어진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부당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됐다고 짚는다(사진). 이런 행태와 욕구 불만이 동시에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우익들의 혐한 시위라고 꼬집었다.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문화인류학 분야 고전으로 꼽히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서는 서양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경리 선생은 ‘일본산고’라는 산문집에서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라고 일갈했다.

연합뉴스

이케다 기요히코 교수는 저서 ‘자숙을 강요하는 일본’에서 혐한을 일삼는 일본인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며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받은 탓에 주어진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부당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됐다고 짚는다. 이런 행태와 욕구 불만이 동시에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우익들의 혐한 시위(사진)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생물학자인 이케다 기요히코 야마나시대 명예교수는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며 다수의 편을 들고 작은 일에 대해서만 ‘정의감’이 폭주하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그렇게 관찰하고 숙고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판은 매섭다.
일본인들이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면서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치 제도 때문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받았을 뿐 한국처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본 경험이 없다. 여기에 변화를 두려워해 주어진 현실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습성 때문에 사회·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도 정권을 바꾸려는 시도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도 듣기 어렵다.
일본인이 파헤친 ‘일본인의 민낯’
2차 대전 후 민주주의 강제 이식에
비판 두려워 문제 발생해도 ‘침묵’
다수 의견 따르며 개인 책임 회피
욕구 불만은 약한 사람 골라 해소
‘왕따’ ‘정의감 중독’ 등 퇴행적 행동
日 ‘생각 없음’ 문화 닮아가는 한국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시스템 속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소소한 이득이나 취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면 개인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지는 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만을 좇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도 퇴행적이다. 바로 ‘왕따’와 ‘괴롭힘’, ‘정의감 중독’ 현상이다. 강한 사람에게는 입을 다물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비난한다. “물에 빠진 개를 몽둥이로 때릴 뿐 아니라 돌까지 던지는 것이 일본의 국민성”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혐한을 조장하고 평화헌법 폐기를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우익 네티즌(넷 우익)들의 내면엔 이런 심리가 가득하다.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처치하는 일에 쾌감을 느낀다. 역대 총리들과 비교하면 학력도 시원찮고 논리 없는 말만 일삼던 ‘금수저’ 아베 신조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넷 우익의 열광을 배경으로 한다고 저자는 비판했다. 넷 우익 입장에서 보면 아베는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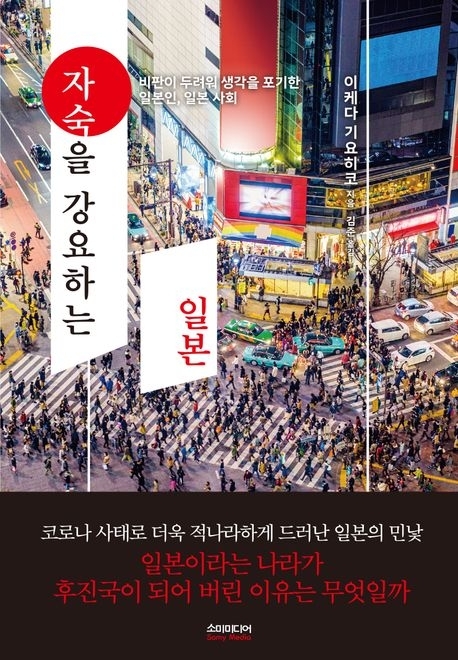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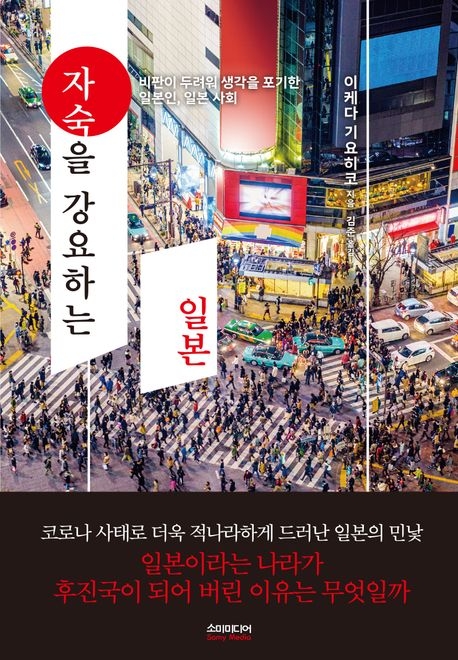
일본인이 일본과 일본인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본문에 나오는 ‘일본’이란 단어를 ‘한국’으로 바꿔도 썩 이상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처럼 ‘생각 없음’ 문화가 이미 우리 사회를 잠식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2023-08-1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