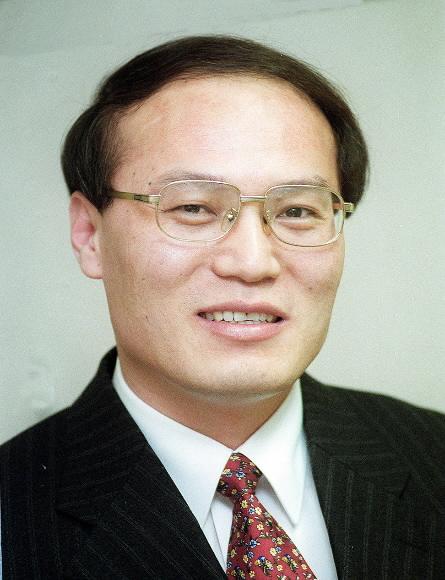

육철수 논설위원
외신의 평양 르포엔 한 주민이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긴장이 높아져도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터뷰도 담았다. 핵폭탄 한 발 쏘면 그걸로 끝장인데 여러 사람이 요란 떨 일 있느냐는 투다. 핵무기 덕분에 주민들도 배짱이 두둑해진 모양이다. 하기야 20년 동안 북한은 핵으로 재미를 꽤 봤다. 핵으로 적당히 겁을 주면 미국이 “말로 하자”며 쪼르르 달려오지, 한국은 쩔쩔매다가 돈 보따리를 풀어놓지…. 북한 정권에 핵무기는 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요전핵’(搖錢核)이 된 지 오래다. 그곳 주민들이 평온한 걸 보면 그들도 핵무기가 전쟁용이 아니라 부(富)를 창출하는 도깨비방망이란 사실을 이젠 눈치챈 것 같다.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요긴하게 써먹은 나라는 북한이나 이란에 앞서 프랑스가 원조 격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유르겐 브라우어는 저서 ‘성, 전쟁 그리고 핵폭탄’에서 이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1960년 알제리에서 60kt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배, 당시 소련이 보유 중이던 수소폭탄의 1900분의1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한방’으로 세계 핵 대치의 본질을 바꿔버렸다고 한다. 미국과 소련의 핵 독점을 깼을 뿐만 아니라 2차대전의 치욕과 베트남전 패배로 위축됐던 국가의 자존심과 장엄성을 회복했다. 재래식 군대와 무기를 대체하고도 남을 전쟁 억지력도 갖추는 등 이문이 많이 남은 장사였다는 게 브라우어의 분석이다. 그는 “핵이야말로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드는 과격한 수단이자 보유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헌법에 명시까지 해서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떼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장난이 이제는 짜증스럽다. 오죽하면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까지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목청을 높이겠는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이상이 이에 동조했다. 성질대로라면 핵무기를 빨리 만들어 북한의 못된 버릇을 당장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냉정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핵에는 핵’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이 그럴듯해 보이나 공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의 핵우산 체제가 이끄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면 본전은 찾는다. 물론 급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핵무기를 운용할 순 없지만 아직까지 억지력으론 손색이 없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수백~수천 기의 핵전력을 갖춘 미국·러시아·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핵무기 선택권(Nuclear Option)을 가진 일본도 덩달아 무장할 것이다. 핵무기는 이미 강대국의 기득권이 돼 버렸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일지도 모른다. 1960~70년대처럼 핵무기에 대한 국제 감시망이 어수룩할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전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해 전쟁 억지력과 자위권을 확보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립된 북한 짝 나지 말란 법도 없다. 핵무기가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어떤 나라도 감히 실전에 써먹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굳이 핵무기를 가져 이웃 나라와 불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ycs@seoul.co.kr
2013-04-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