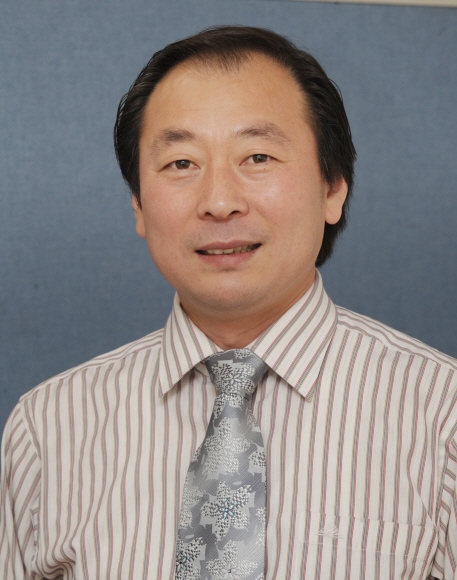

김성호 논설위원
작금에 쏟아지는 교육 정책들은 따져보면 한결같이 경쟁을 통한 질의 향상을 겨냥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이란 큰 틀 아래 말이다. 덩달아 우열의 경쟁과 그로 인한 적자생존의 가치가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 수요자’란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굳이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있다면 당연히 공급자가 있게 마련이다. 학부모·학생의 수요자와 학교·교사라는 공급자의 대칭 구도 속에 교육은 이제 상품의 가치로 변해 버린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수업을 평가받는 교원평가제, 우수한 교장을 초빙해 학교를 관장케 한다는 교장공모제,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택해 진학하도록 하는 고교선택제, 여기에 개별 학교들의 학업능력 성취와 수능성적의 공개. 학교와 교사가 시장이라는 엄혹한 경쟁판에 놓이고 그 결과로 우대와 도태라는 냉혹한 판정의 가름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교편(敎鞭)은 이제 무색하기만 하다. 사랑과 존경이란 아름다운 가치의 소멸이라 할까. ‘학원보다 못한 학교’ ‘단순지식을 전달하는 노무자 선생님’ 이것 말고도 우리의 무너진 공교육을 보여주는 일탈들은 아주 흔하다.
학부모가 교사의 무릎을 꿇려 욕설을 퍼붓고, 학생이 휴대전화를 뺏은 교사를 폭행한다. 꾸짖는 교사에 맞뺨을 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교사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누나 사귀어 보자.’고 외치는 남학생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난 8년간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폭언 같은 교권침해 행위가 9배나 늘었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의 조사결과조차도 이젠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최근 1∼2년 새 교직 만족도와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5%나 되고 그 이유로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 상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사실이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기념하고 기릴 날들이 유난히 많은 오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 모레면 스승의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의날은 가장 홀대받는 날이 되어버렸다. 불미의 일들을 피하기 위해 스승의날을 전후한 재량휴업이 학교에선 번진다고 한다. 스승의날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끄럽다는 교사들의 푸념이 괜한 게 아닌 듯하다.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은 올해 스승의날 기념식을 갖지 않는단다. 스승의날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육비리를 의식한 처사라지만 교사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한 것만 같아 안타깝다. 스승의날에 스승이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스승의 높임은 당연한 미덕이요, 으뜸가치로 여겨진 때가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추락한 교권을 세울 이들은 교사 자신이라면 철 모르는 말일까. 현실은 교권신장을 위한 법·제도를 우선 마련하라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냉혹하기만 하다. 입시교육과 경쟁에 쏠린 학교의 몰락과 무너지는 교사의 권위만을 탓하고 앉아 있기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교사들이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회초리를 들라. 경쟁력과 실력을 피할 수 없는 지금 사회에서 생존의 무기를 갖춰서 말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 않는가. 내년 스승의날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기념식을 성대하게 갖기를.
kimus@seoul.co.kr
2010-05-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