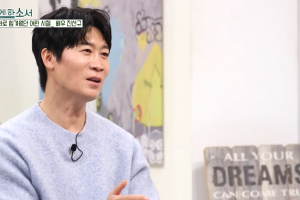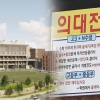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친구들-숨어 있는 슬픔’은 세월호로 친구를 잃은 아이들의 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명수 선생이 기획하고 이종언 감독이 연출을 맡았지만 숨어 있던 친구들의 슬픔을 찾아낸 건 같은 또래로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공감기록단’이다. 지금껏 ‘세월호로 친구를 잃은 세대’의 목소리가 언론에 등장한 일은 거의 없었다. 침몰의 원인과 대통령의 7시간과 책임자 처벌 등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조차 배제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나 그 세대는 아무런 대사조차 주어지지 않은 엑스트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얼른 잊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정도가 유일한 임무였다.
지난달 21일 대한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친구들’ 상영회가 열렸다. 그곳에서 나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다. 어제까지 떡볶이를 함께 먹던 친구를 잃고 새벽에 일어나 이불 속에서 종이를 찢는 습관이 생긴 민지양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는 말을 듣고 난 이후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집 밖에서는 늘 밝은 척을 하려 애썼다 한다. “내가 울면 쟤는 왜 저렇게 나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종현군은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를 잃었지만 “단원고도 안 나왔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어쩐지 가족을 잃은 분들보다 더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답답함을 혼자 삭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나는 김탁환 선생과 함께 조촐한 상영회를 계획했다. 장소는 이렇다 할 친분도 없는 책방 ‘그래요, 우리는’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굳이 자리를 마련한 건 세월호 리본을 목에 걸게 된 이유와 비슷하다. 같은 화면을 두 번째로 마주했을 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함께 관람한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과 묻어 두었던 속마음을 나누며 이런 생각을 했다. 카메라에 비친 아이들은 나 혹은 당신일 수도 있겠구나. 침몰의 원인과 대통령의 7시간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면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수 있을까. 정혜신 박사의 말마따나 이것은 얼른 떨쳐 내야 할 기억이 아니라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겠다. 사자(死者)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다 끝난 일이니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두자며 덮어 버림으로써 어두운 역사 속에 방치된 여러 사건들이 떠올랐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분투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함께 관람해 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덧붙이자면 상영회 개최는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무료로. 신청은 ‘치유공간 이웃’에서 받는다.
2017-10-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