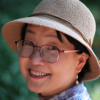이기철 사회부 차장
나아가 변호사, 즉 ‘고소대리인’을 붙여달라고 하는 검사가 제법 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귀띔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으로, 등록 변호사 2만명 시대에 고소대리인이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업무영역이 됐다. 고소인이 검사의 얼굴을 보고 하소연하거나 조사받기는 쉽지 않게 됐다. ‘이건 아니다’ 싶지만 검사는 바쁘디 바쁘니 백번 양보해 그럴 수도 있다고 치겠다.
변호사는 ‘밥값’하느라 고소인의 주장 요지와 쟁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에게 건네준다. 사법 절차에 어두운 고소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건처리가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돌아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검사도 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라고. 이쯤 되면 변호사에게 수사에 나서라는 말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는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것이 의무다. 이를 변호사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국민이다. 아무리 바빠도 검사는 이들에게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해야 한다.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시비를 판단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기본이다. 검사윤리강령 제1조에 나온다.
더 기막힌 일은 변호사에게 “불기소처분 결정문까지 써서 가져오라”고 하는 검사도 있다는 것이다. 사건 대리인에게 써오라니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이런 행태는 검찰 전반에 수사 열정이 사라지고 샐러리맨화한 탓이다. ‘수사 DNA’가 단절되고 있는 것은 증거 조작과 성추문 등 잇따른 악재에 검찰이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체포동의서가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검찰이 길길이 날뛰기는커녕 “결정을 존중한다”며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치명상의 증좌다. 세월호 유족 폭행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라기보다는 경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가 깨끗한 것은 결코 아니다.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올해 ‘국가 부패수준’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아시아 16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8위 중국과 6위 타이완 사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최고경영자들이 일반인이 아닌 한국사회 지도층을 만나 경험한 것을 점수화한 것이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패 수준이다.
부패 수사에서는 검찰은 정치인과 ‘관피아’에 집중해야 한다. 미약하지만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수사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국민이 많다. 게다가 조사받는 이가 검사보다 윤리나 도덕성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법치라는 건물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높이 세워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먼저 기반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 검사의 기반은 윤리와 도덕성을 되찾는 일이다.
chuli@seoul.co.kr
2014-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