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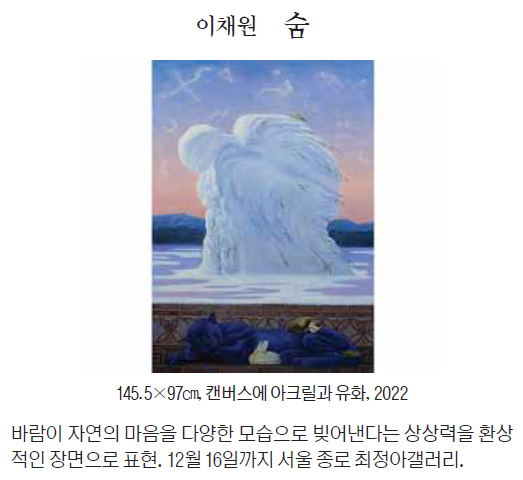
안쪽으로
날이 휘어지고 있다
찌르지 못하는
뭉툭한 등을 너에게 보이면서
심장이 있는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있다
팔처럼
날은 뭔가를 껴안으려는 것 같다
푸르고 둥근 줄기
핏줄 다발이 올라가는 목이
그 앞에 있다
뜨겁고
물렁한 것이 와락 안겨올 것 같아
날은 몸을 둥글게 말아
웅크리고 있다
도끼나 칼의 날이 수직으로 박힌 것에 비해 낫은 ‘뭉툭한 등’과 같은 곡선입니다. 날의 방향도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고 ‘심장이 있는 안쪽’으로 구부러졌습니다.
‘낫’은 이상한 역설과 같은 연장입니다. 본래 베거나 끊는 도구인데, ‘팔처럼 뭔가를 껴안으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몸을 둥글게 말아 웅크린’ 모양은 공격보다 방어하기에 적합한 자세 아닌가요.
그 모양이 다정하게 껴안는 척 무정하게 베어 버린 시간 같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용서는 할 수 없는 마음 같습니다. 상처를 내기도 전에 먼저 내상을 입은 묘한 마음의 형태가 이와 같을까요? ‘푸르고 둥근 줄기’를 뭉텅뭉텅 잘라낸 비명, 언젠가 내뱉은 서슬 푸른 말의 다발을 떠올립니다.
신미나 시인
2022-12-0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