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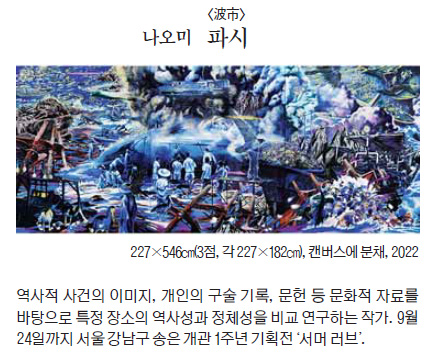
잊었던 태양신이 도착했다 생선 궤짝 뒹구는 자갈치 뒷길
그는 수척했다 너무 늙었다 하루하루 몸을 입는 일이 비리다
담벼락에 낙서하던 계집애는 이제 장화를 신고 갈치를 팔고 있다
수직과 수평을 다 삼켜버린 저 환생, 친한 듯 오래 응시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적막의 발치, 쭈빗쭈빗 칸나가 흔들린다
노랗게 거싯물 게우며
피어나는 일이 중력을 경영하는 전부이니, 그저
칸나가 한창이다. 가장 뜨거운 나날들을 골라 피어나느라 그것은 붉디붉은가? 한 번도 보지는 못한 ‘태양신’을 닮았다. 게다가 ‘비린’ 삶들이 모인 비린 시장 모퉁이에 피었으니 그를 보아 주는 이도 많지는 않겠다. 엄마가 신던 장화를 신고 엄마가 팔던 ‘갈치’를 딸이 맡아 팔고 있다. 딸은 가끔 허리를 펴고 칸나꽃을 건너다본다. 적막 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여름 꽃에 엄마의 모습이 얼비치는 모양이다. ‘칸나가 흔들린다!’ 꽃은 ‘중력’을 경영하나 그것도 잠시뿐 곧 이기지 못하고 스러지리라. 그러나 삶은 오직 ‘피어나는 일’이 전부일 뿐임을 아는 고로 그 사태를 보지는 않으리라.
장석남 시인
2022-08-2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