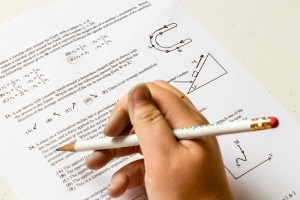중고교에 확산하는 ‘신종’ 심리 전염병을 막아야
중 2 여학생이 부모와 진료실에 들어왔다. 아이는 반성문이라도 쓰다 온 듯 풀이 죽어있었고, 날이 꽤 더운데도 긴팔 옷을 입은 것이 눈에 띄었다.
“아이가 자꾸 몸에 칼을 대요”
왼쪽 팔뚝을 걷어올려 보라 했다. 수 십 개의 베인 상처가 미술 수업을 하고 난 책상 위같이 죽죽 그어져 있었다. 꼬메야 할 정도로 깊지는 않고, 10cm는 족히 넘은 길이였다.
“죽고 싶어서 했니?”
“아니요, 답답해서요. 화가 날 때도요.” 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생활의 다른 영역과 수면, 식욕, 우울한 감정등을 평가했다. 우울한 건 맞지만, 자살을 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 어디서 알게 되었냐 묻자, “친구들이 해요. 카톡이나 SNS에 사진을 올려요.”
어떤 기분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후련해요. 멍하다가도 아프고 피가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라고 말한다.
이런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주변의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일산, 대구, 분당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병원을 찾아온단다. 전염병같이 퍼지고 있다. 보통 부모는 아이의 우울증을 부정한다.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어한다.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울해 하느냐고. 그래서 초기에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큰



![[포토] 서울시교육청, 시험지 유출 의혹 고교 감사 실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8/16/SSI_201808160938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