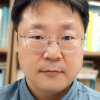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골에서 사람 보기란 하늘의 별 보기만큼 어렵다. 농사짓는 사람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긴 지도 오래다.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도 도시로 나가면서 초등학교 분교는 문을 닫았고, 빈집은 늘어만 가고 있다. 산부인과 찾기도 힘들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에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없다. 지난해는 정부 수립 이래 72년 만에 총인구가 감소한 해였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81명이었다. 유엔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정부가 또 다른 인구 감소 극복 방안을 내놨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이다. 올해부터 10년간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원)을 전국의 기초지자체 107곳(인구 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과 인구가 줄지 않는 서울, 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에 배분한다. 107곳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수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는 이런 지자체 관할 지자체다. 지원 규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올해는 내년분까지 합쳐 2년치를 지역별로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씩 준다. 이후에는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된다.
10년간 약 10조원을 소멸 대응기금으로 쏟아붓는다고 해서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게다. 당장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만 하더라도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것이어서 지방의 인구 소멸 대응 효과를 떨어뜨린다. 각 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의 가치’를 확산시키길 기대해 본다.
2022-08-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