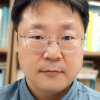그레고리우스 7세는 국왕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교황의 권위를 되찾기로 결심한다. 국왕과 황제들에게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박탈했다. 나아가 “앞으로 모든 국왕은 내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고 공포했다.
하인리히 4세는 “내 나라 성직자를 내가 임명한다는데 교황이 웬 시비냐”며 힘겨루기에 나섰고, 교황은 파문이란 뜻밖의 승부수를 꺼냈다.
하인리히 4세에게 불만이 쌓여 있던 제후들은 콧노래를 불렀다. 그래도 자신만만했던 황제이지만 제후회의가 소집돼 황제 선출 논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겁이 덜컥 나 카노사 성에 머무르던 교황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1255년 레지오인들에 의해 파괴돼 지금은 흔적만 남은 카노사 성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한겨울 알프스를 넘은 하인리히 4세는 성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인리히 4세는 수도사처럼 내복 차림에 가위(참회로 머리를 자르겠다는 의미)와 빗자루(교황의 매를 달게 맞겠다는 의미)를 들고 사흘 내내 참회의 눈물을 흘린 뒤에야 1077년 1월 28일,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고 파문을 면할 수 있었다. 교권(敎權)에 속권(俗權)이 고개를 숙인 상징적인 장면이다.
10세기 전의 일을 돌아본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 정치평론가가 그제 방송에 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용서를 빌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카노사 비화’를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와 갈등을 빚고 부산과 순천 잠행 중이다. 5년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에 이어 역사가 무한 반복된다고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중세 때의 일을 갖다 붙인 것부터 시대착오 같다. 더욱이 그 평론가가 빠뜨린 반전이 있다. 3년 동안 와신상담한 하인리히 4세는 반기를 들었던 제후들을 차례로 제압한 뒤 로마까지 함락,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했다. 남부 살레르노로 쫓겨간 그레고리우스는 이듬해 초라하게 생을 마감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인데 이 얘기는 왜 쏙 뺐는지 모르겠다.
2021-12-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