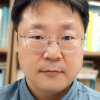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 능력마저 취약해졌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지난 2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2.8%로 61개국 중 가장 높았다. 소득보다 많은 빚으로 잔치를 벌이는 수준이란 의미다. 여기에다 우리 가계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라 유동성이 극히 취약하다. 가계와 함께 영세 기업들도 당장 소폭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국가채무, 즉 나랏빚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65조 9000억원의 나랏빚이 내년에는 1091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 따른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빚도 자산이라 주장한다.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의 말이다. 금리 인상이나 수입 감소 등으로 상황이 변하면 과도한 빚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언제든 빚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2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 시대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의 비정함보다 더 가혹한 고충을 온 국민에게 안겨 준 빚의 함정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팬데믹 상황의 재난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도 이해되지만 능력치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
yidonggu@seoul.co.kr
2021-06-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