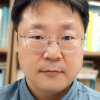비슷한 재판의 원고로 참여해 3월 1심 선고를 앞둔 이 할머니는 “일본의 배상금을 받으려 재판한 게 아니다”라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역사 교육 반영, 역사기념관 설립 등 피해자 인권 구제에 재판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ICJ에 한일이 같이 가서 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 호소대로 한일이 위안부 문제를 ICJ에 넘기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협정 3조에 따라 판결을 분쟁 발생으로 간주해 중재를 신청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양국 합의하에 ICJ에 갈 수 있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때는 일본이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기했으나 한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 최고의 법원이 내린 판단인 만큼 정부가 굳이 중재에 응할 까닭이 없었다. 당시 국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 일부가 ICJ 회부를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일본의 술책에 말려드는 데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다.
위안부 판결 뒤 일본에서도 대한국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ICJ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춤하다.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법 재판 흐름에서 일본이 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다. 국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기본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재판하자 역제안하면 독도나 강제징용까지 포괄하게 돼 한국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제강점기 폐해의 도덕적·역사적 문제가 법적인 단계로 가면 의미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CJ 재판 경험은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다. 그런 차이를 빼고라도 역사 문제를 양자가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marry04@seoul.co.kr
2021-02-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