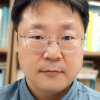그런데 금과 은은 좀 다르다. 인도,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귀금속으로서의 금에 대한 애착이 크다. 실제 인도 정부는 2013년 경상적자의 주범으로 금을 지목해 관세를 2%에서 10%까지 올리기도 했다. 금에서 장식용 수요가 전체의 절반이고 투자용도가 24% 정도, 그리고 산업용 수요는 10% 안팎이다.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절반이 넘는다.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 컴퓨터,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의 재료로 쓰인다. 항균 능력도 뛰어나 항균제 성분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때로는 경기 불황이 예고되면 은값이 내리기도 한다. 은값이 금값을 따라 오르는 것은 ‘가난한 자의 금’으로서의 수요 탓이 크다. 또 은값은 금값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
생활에서의 용도는 은이 금보다 뛰어나다. 조선시대를 그린 영화에서 왕의 밥상에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은수저가 늘 있다. 출신 성분을 뜻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에서 왕은 분명 ‘금수저’ 이상인데 그의 생활에는 은수저가 기본이다.
화폐의 역사에서 보면 은이 금보다 앞섰다. 영어의 ‘뱅크’(bank)가 ‘금행’(金行)이 아니고 ‘은행’(銀行)인 까닭이다.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은본위제였다.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 시절 개발된 은광을 토대로 한때 은본위제를 실행했다. 은본위제란 그 나라의 특정 화폐 가치를 ‘은 몇 g’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 몇 g’을 특정 화폐 가치와 묶으면 금본위제다. 미국은 금·은본위제를 거쳐 금본위제만 실행했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이를 폐지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금값과 은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금·은 교환 비율이 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87.8이다. 즉 같은 무게라면 금값이 은값의 87.8배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은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라며 앞으로 은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금은 물론 실물거래가 쉽지 않은 은과 관련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파생금융상품도 투자자를 유혹한다. 주식도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데 파생상품이라니까 선뜻 투자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는 실물이 투자자산으로 꼭 최고가 아닐 텐데 말이다.
2019-08-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