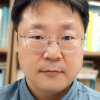람보르기니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를 집어삼키고 있던 폭스바겐이다. 20% 가깝게 스즈키 주식을 가진 폭스바겐이 마음만 먹는다면 스즈키를 인수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데는 폭스바겐이 스즈키 승인 없이 주식 매입·매각을 못 하게 한 ‘스탠드스틸 협정’(standstill agreement)이란 방화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수합병(M&A)에서 ‘매수의 목표물이 된 기업과 매수하려는 기업의 합의 없이 주식의 추가 매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스탠드스틸은 피매수 기업에는 대응 전략을 짤 시간을 벌게 해 주고, 매수 기업에는 적대적 매수의 나쁜 이미지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스탠드스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등장하는 것은 2008년이다. G20 첫 회의가 열린 워싱턴에서 한국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금지하자’는 스탠드스틸 제안을 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14년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정부는 스탠드스틸이란 생소한 말을 썼는데, 전염을 막기 위한 이동 중지 명령이 그 뜻이다.
중지란 뜻의 스탠드스틸이 한일 분쟁에 등장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스탠드스틸 협정에 합의할 것을 양국에 촉구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으로 30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31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일의 갈등 격화와 한미일 공조 약화를 우려하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생각했을 법한 아이디어이다. 한일과의 동맹국 미국의 휴전 제안인 셈이다.
조선 정벌이라도 나선 듯한 일본과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는 ‘노 재팬’(No Japanㆍ일본 안 돼)·불매운동의 한국이 한발 물러서 머리를 식히고 대화로 해결하라는 게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못 받을 이유는 없겠다. 하지만 대화에는 상대가 있는 법. 미국의 섣부른 관여가 졸속 위안부 합의를 낳은 것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지금의 한일 분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자가 푸는 게 맞다.
한국 정부의 대일 원칙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부당한 경제보복의 신속한 철회, 한일 분쟁의 배경이 된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법부 판단의 존중, 피해자 중심주의 등 3원칙은 꼭 관철돼야 한다.
marry04@seoul.co.kr
2019-08-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