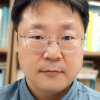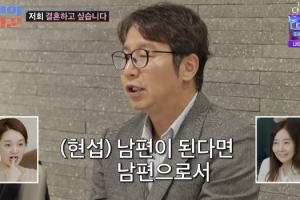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 법조계를 뒤흔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둔 터라 경찰은 열심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경찰은 2013년 7월 성접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하고 특수강간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듬해 7월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며 이모씨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역시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주요 증거를 누락한 데다 의혹의 초점이었던 뇌물 대신 강간 혐의를 적용한 터라 사건의 ‘스텝’이 꼬여 버린 측면이 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잡범’이 아닌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당시 사건을 허술하게 처리한 검찰도, 그 책임을 경찰에만 떠넘긴 조사단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가 사건 축소의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인사권을 독점한 청와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검경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해법이다. 검찰도 공수처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은 6월 30일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임계치에 다다랐다.
douzirl@seoul.co.kr
2019-03-06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