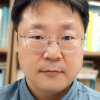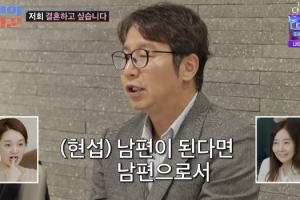아무튼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27㎝ 이상의 명태 조업은 가능했는데, 이제는 크기와 상관없이 명태를 잡지 못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10년 넘도록 근해에서 씨가 말랐던 명태가 다시 동해로 돌아오기 시작해 국내 어족 자원으로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1991년 1만톤 이상 잡히던 명태는 2007년 35톤까지 감소했다. 이후 ‘국산 명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생선이 되고 말았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시작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명태 양식화에 성공해 치어를 방류한 것인데, 지난해 어획량이 7~8톤으로 늘어났다. 최근 명태가 동해에 나타났다지만, 방류한 치어라고 보기는 어렵단다.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명태는 숱한 이름을 한 몸에 갖고 있다. 싱싱할 땐 생태, 얼리면 동태, 바짝 말리면 북어, 반쯤 말리면 코다리, 얼리고 녹히며 말리면 황태, 그러다 빛깔 검어지면 먹태 등등. 이렇게 사랑받던 명태가 사라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다. 둘째는 러시아 오호츠크해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서 많이 잡아 버리기 때문이다. 셋째가 치어인 노가리를 남획한 탓이다. 을지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가리 놓고 술 마시던 술꾼들로선 술이 번쩍 깰 만한 소리겠긴 하다.
명태 조업 금지 발표에 이제 생태탕을 못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걱정은 접어 둬도 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생태탕의 99%는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1% 또한 러시아산이다. 우리 곁에 명태가 떠난 지는 이미 오래다. 연안에서 잡은 싱싱한 생태로 찾아오는 건 아직 불가능하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30~40년쯤 뒤 술꾼들은 이렇게 ‘노가리’ 풀며 술잔 부딪칠지도 모를 일이다. “예전엔 노가리를 술안주로 먹었다면서?”, “생태탕은 전부 일본산이었대!” 하면서 말이다.
youngtan@seoul.co.kr
2019-02-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