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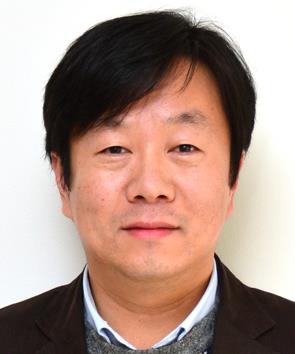
유용하 사회부 차장
최근 ‘백신’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최초의 백신은 18세기 말 영국의 제너가 만든 천연두 백신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한 것은 프랑스의 파스퇴르다. 미생물학자인 파스퇴르는 연구 초기부터 동식물 감염병 치료라는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면역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탄저병, 광견병, 닭콜레라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연구 성향 때문에 과학정책에서도 파스퇴르의 이름은 자주 언급된다. 미국 과학기술정책학자 도널드 스토크스가 만든 ‘파스퇴르 4분면 모델’이 대표적이다. 파스퇴르 4분면 모델은 함수 그래프처럼 성과 활용 여부와 연구 성격을 X축과 Y축으로 해 4개의 면으로 나눠 과학 연구의 특성을 설명한다. 1사분면은 파스퇴르 같은 응용지향적 기초연구, 2사분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순수기초연구, 4사분면은 에디슨처럼 완전 응용연구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논의의 결론은 한국의 특성상 바로 산업 현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파스퇴르식 기초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들어 미래 먹을거리로 바이오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시작됐다. 지난 4일에도 정부는 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약 2조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정부 연구개발 역량을 총집결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득 지난 20년간 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닻인지, 돛인지를 올렸던 수많은 사업들이 항구를 떠나기는 했는지, 출항과 동시에 가라앉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떠올랐다. 현재 국내 바이오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바늘 없는 나침반을 갖고 출발했다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짝하고 시작됐다가 그 이후를 알 수 없는 연구개발 사업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떴다방 같은 반짝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다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는 더 빨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백신 개발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충분한 지원과 연구의 연속성,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맛있는 돌솥밥을 만들기 위해서도 충분한 화력과 뜸 들이는 시간은 필수다. 쌀이 익을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는 설익은 밥이 되기 십상이다.
애매한 화력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도 ‘연료를 잔뜩 투입해 화력이 좋은데도 왜 밥맛이 없냐’고 타박한다든가 ‘벌써 밥이 됐을 시간인데 아직도 안 됐냐’며 수시로 뚜껑을 열어 보는 분위기만 바뀐다면 우리도 K백신, K과학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를 것이다.
edmondy@seoul.co.kr
2021-03-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