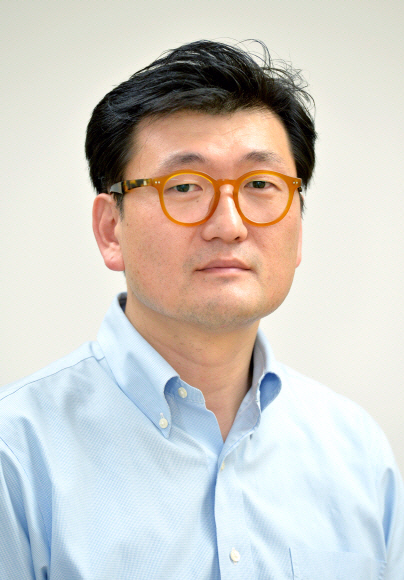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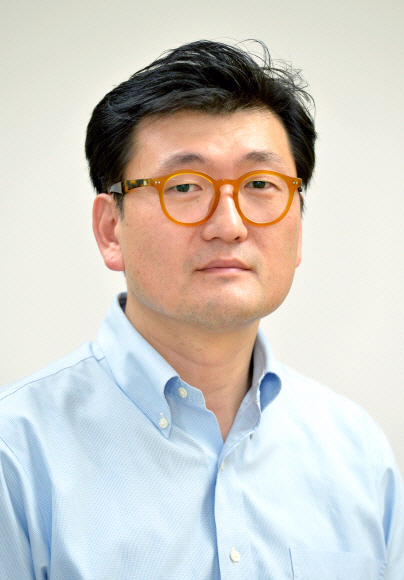
유영규 사회부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무심히 종이 한 장을 툭 내밀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였다. 어느덧 여든에 가까워진 아버지는 그렇게 종이 한 장을 통해 ‘본인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아버지가 떠날 채비를 하시는 듯해 만감이 교차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뭔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잘하셨다”고 하자니 내심 섭섭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고,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자니 생각과는 다른 말을 내뱉는 듯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사를 써왔고 주변에도 그런 의사를 밝혀 왔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미닝아웃’(신념(meaning)과 나오다(coming out)의 합성어. 자신의 취향이나 정치·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혹스러웠다. 한참을 애먼 TV만 멀뚱멀뚱 바라봤다.
우리 가족에겐 아픈 기억이 있다. 11년 전 어머니는 폐암 선고를 받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다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정작 어머니는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당의사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절대 환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비소세포성 폐암인데 미국에 가도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환자에겐 절대 6개월 남았다는 이야길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 정신력이 강하신 분도 3개월을 못 버팁니다. 먹는 표적치료제인 이레사를 써 볼 테지만 장담은 못 합니다.”
그의 처방은 잔인했다. 가족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가족이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마감할 기회 자체를 앗아가라는 주문이었다. 의료윤리적 측면에서도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
하루하루가 딜레마였다. ‘본인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 ‘가족이라고 해서 이럴 권리가 있을까’ 고민스러웠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가족들의 하얀 거짓말이 시작됐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아들, 부탁인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해. 그래야 엄마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정리할 일들도 정리하지….”
본인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어머니는 먹는 약과 병에 대해 솔직히 말해 달라고 했다. 그때마다 “괜찮다”고만 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실은 적당한 시점엔 말씀드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병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나빠졌다. 암세포가 몸 곳곳으로 전이되면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다시 환자를 들쳐 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다. 평생을 엄마이자 아내로 사는 게 먼저였던 어머니의 버킷리스트는 결과적으로 가족들에 의해 지워졌다.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었다.
얼마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것도, 몹쓸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그저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미루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의향서를 작성한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비교적 존엄하게 마무리하고픈 마음에서다.
문득 “왜 이야길 안 했냐”며 아내가 섭섭해할 거란 생각도 든다. 마지막을 준비하려는 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련다. 아버지에게도 못 했던 이야길 건넬 생각이다.
“잘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덕분에 등록했어요.”
whoami@seoul.co.kr
2020-05-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