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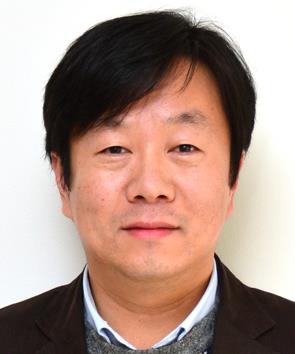
유용하 사회부 차장
발언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이작 뉴턴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뉴턴은 1688년 명예혁명 직후 구성된 의회에 케임브리지대학 몫으로 배정된 의원 2명 중 한 명으로 추천받아 국회에 입성했지만 성격이 조용해 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1699년 조폐국장에 임명돼 25년 넘게 화폐위조범들의 저승사자로 활약한 것을 보면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명예혁명 직후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이 많은 의회에서 과학자 출신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발언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주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를 놓고 과학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인사가 하나도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과학계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 비례대표 후보자 중 후순위에 배치돼 이런 결과는 예견됐었다. 현재 과학계로 분류되고 있는 비례 당선의원들도 전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벤처 쪽 인사들이어서 엄격히 따지면 21대 국회에서 ‘과학자 출신 의원’은 하나도 없다.
과연 과학자 정치인이 전무하다고 해서 과학계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우려에 앞서 이전에 과학계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이들이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과학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다른 의원들보다 날카로웠다든지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기억은 거의 없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매년 비슷한 질의를 반복하고 과학이 교육이나 ICT 분야와 합쳐지면서 과학정책이 표류하고 있을 때도 언론 주목도가 높은 교육이나 휴대전화 사용료 같은 이슈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계 출신 의원들이 열었던 정책토론회들도 매번 비슷한 주제에 똑같은 이야기가 무한 반복되는 탁상공론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과학계가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왔던 연구과제중심예산제도(PBS)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 연장 등의 문제도 제자리걸음이었다. 330년 전 정치인 뉴턴만큼이나 존재감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학계 목소리 전달 창구로 과학자 정치인이 굳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현대 과학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국내 과학계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한 존재감 없는 모습 때문에 과학선진국의 연구자들만큼 신뢰를 받지 못해 왔다. 그렇지만 최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신뢰감을 갖게 됐다고들 한다. 지금처럼 대중의 신뢰를 배경으로 한다면 과학자 출신 의원 없이도 과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치권과 행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계가 해야 할 일은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국민 신뢰를 얻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과학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에 나서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edmondy@seoul.co.kr
2020-04-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