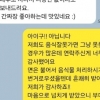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에서 이조전랑과 비슷한 직위를 찾으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꼽고 싶다. 직급은 국무총리나 장관보다 낮지만 그 권력의 크기는 1인지하(人之下) 모든 공직자의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서슬 퍼렇다.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하거나 추천하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 등의 부정을 감시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등 각 정보·사정기관에서 올라오는 고급 정보를 취합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간접 지휘(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권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인한다)하는 자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이 막강한 민정수석 권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력, 즉 역대 정권이 모두 부인해 온 그 권력이 지난 7월 16일부로 검찰총장에게 넘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일약 검찰총장에 임명된 날이다. 윤 총장이 임명된 이후 단행된 기수 파괴적인 검찰 인사로 70여명의 검사가 줄줄이 옷을 벗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인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조선시대로 치면 사헌부 수장(대사헌) 내지 의금부 수장(판사)이 이조전랑의 권력까지 꿰찬 셈이다.
그리고 이후 검찰 개혁론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상전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과거 대한민국 역사에선 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 시리즈가 시작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도중에 장관 후보자 부인을 검찰이 전격 기소한 일 등은 모두 사상 초유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 이유를 분석하는 정치학적, 사회과학적, 윤리학적 언설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런데 각도를 틀어 순전히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된 검찰총장의 힘이 외부로 급속히 팽창,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권력 내부의 밀도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국가 권력 전체에 빅뱅(대폭발)을 몰고 왔다는 얘기다.
조선시대 3사는 임금을 쥐고 흔들 정도로 권력이 강했다(사실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나라였다). 그런 3사의 핵심인 사헌부와 의금부에다 이조전랑 권력까지 합체가 돼서 왕에게 칼을 겨눌 때 임금은 ‘도대체 누가 이 나라의 임금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결국 사생결단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력은 나눌 수 없고 대등할 수 없다. 대등해지면 다시 대등해지지 않을 때까지 싸운다.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정재)은 김종서(백윤식)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면서 천재 관상가 내경(송강호)에게 이렇게 절규한다.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인가, 김씨의 나라인가. 태조께서 피 흘려 세운 종묘사직을 가지고 노는 것들! 네가 손잡은 늙은 호랑이가 내일 당장 어린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쓰고 보니 왠지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carlos@seoul.co.kr
2019-10-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