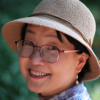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그 댓글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답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소방관이 죽거나 다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질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다른 사람의 직업과 목숨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번에 제천 화재를 기사로 다루면서 소방관과 그 가족의 ‘실존’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됐다. 소방관의 가족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얼음판일까.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사이렌 소리는 보통 사람에게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있지만, 소방관의 가족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악마의 경종일 것이다. 혹시 자신의 남편(아버지, 아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아닌지, 출동했다가 끔찍한 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노심초사일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아버지, 아들)을 보면서 혹시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닐까 매번 사별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방관 가족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는(가능성은 상존하지만) 나라,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군인과 경찰보다 위험한 직업이 소방관이다.
평소 타인의 실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소방관이 빨간차를 타고 불을 끄러 다니는 또 다른 보통의 호모사피엔스라고 단순히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소방관은 가장 용감하고 사명감 넘치는 수준의 호모사피엔스보다 단 1 ㎎이라도 더 많은 용기와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소방관은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자해적 행동윤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DNA 보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직업인 것이다. 어쩌면 프로메테우스의 역린을 건드리며 불과 싸운다는 측면에서 소방관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 신의 영역에 근접한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처럼 겁 많고 이기적인 보통 인간은 절대 소방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소방관이 시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할 때,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올 때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아우라는 급전직하한다. 화마 앞에서 몸을 사리는 소방관은 전쟁터에서 몸을 사리는 군인만큼 무의미한 직업이 된다.
우리가 혈세와 정성으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혹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는) 전쟁 때 하나밖에 없는 그들의 소중한 목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방관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혹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는) 화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소방관의 처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돼야 하지만, 처우가 더 개선돼야 불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은 소방관의 신성함에서 멀어지는 말이다. 처우가 안 좋다고 불 앞에서 머뭇거리는 소방관은 처우가 좋아져도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다. 처우는 인간의 영역이고 불에 맞서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carlos@seoul.co.kr
2018-01-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