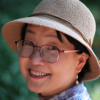임일영 정치부 차장
윤영관 (외교) 장관조차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비관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우리 요청이 수용됐다.”(‘문재인의 운명’ 중)
노무현·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이던 2003년 5월, 그리고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인 2017년 6월은 14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북과 북·미, 한·미가 얽힌 모양새가 너무 흡사하다. 한국의 진보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공화당) 대통령 조합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황 또한 닮은꼴이다.
노무현 정권 초 북핵 문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의 네오콘(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강경그룹) 사이에서 북한 폭격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네오콘만큼이나 힘에 의지하는 일방통행식 대외 전략을 고집하는 건 트럼프 정부도 비슷하다.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 여론 또한 북한에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다.
중국과 맞물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차방정식’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역대 최단 기간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치러야 한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엔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 어떻게든 평화적 해결로 방향을 틀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 14년 전 노 전 대통령이 그랬듯 말이다.
상황과 목표는 비슷해도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협상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지의 존재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과거 한?미 관계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포함됐다.
DJ도 한?미 정상외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미지가 강했던 부시 대통령의 취임(2001년) 직후 불확실성은 극대화됐다. DJ 스스로 “2001년 워싱턴 회담 때 한국을 변방으로, 나를 촌놈으로 알고 무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김대중 자서전 중)고 느낄 정도였다.
고초를 겪고서 DJ는 2002년 초 부시의 방한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격의 없는 ‘텍사스식 대화’를 하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DJ는 부시를 ‘햇볕정책’의 상징적 공간인 도라산역으로 안내했다.
‘결정적 한 방’도 준비했다. 부시가 이희호 여사처럼 감리교 신자임을 알고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19세기 영국에서 감리교의 역할을 언급했고, “설명을 마치자 그(부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고 할 만큼 효과적이었다. 결국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답을 받아 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유의 ‘꿀팁’은 충분히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조언과 철저한 사전 조율이 있더라도 정상외교의 성패는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DJ와 같은 맞춤전략,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뚝심이 아울러 필요한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온다.
argus@seoul.co.kr
2017-06-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