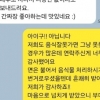김상연 정치부 차장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당 대선 주자들과 당 고문들이 만찬 회동하는 자리가 있었다. 정치인이란 아무리 정적(政敵)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는 비수를 감추고 웃는 시늉이라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다른 대선 주자들이 모두 이인제 전 의원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환담하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창가에 서서 뒷짐 진 채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아주 싫어한다는 소문을 드러내 놓고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호오(好惡)가 분명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했던 사람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다. 요즘 두 사람이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15년 전 뒷짐 진 채 창밖을 내려다보던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두 사람의 경쟁을 어떻게 바라볼까로 상상은 발전한다. 내가 아는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측근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쟁하는 방식 때문에 흥미로워할 것 같다. 그것은 매우 ‘노무현적’인, 그러니까 철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성질의 논쟁이기 때문이다.
안 지사의 대연정론과 ‘선한 의지’ 발언으로 돌출한 두 주자의 이견은 인신공격성 이전투구도 아니고 단순한 정책적 차별성도 아닌 세계관의 변증법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문 전 대표의 세계관은 정(正)이 합(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反)을 거쳐야 하는 변증법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안 지사는 ‘반’을 건너뛰어 바로 ‘합’으로 가자는 파격이다.
문 전 대표의 세계관은 적폐청산(정→반)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는 유효하지만, ‘합’에 도달하기 힘들 수도 있다. 자칫 ‘반’이 지나쳐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반대 진영의 보복을 부르면서 다시 ‘정’으로 역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안 지사의 세계관은 통합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는 유효하지만, 적폐청산이 미진하거나 비리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반’을 거치지 않은 한계로 자칫 정의와 불의가 혼재되면서 ‘합’이 ‘야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누구의 세계관이 시대정신에 맞는지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논쟁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지는 태도는 부박하다. 이 논쟁의 진정한 가치는 논쟁에서 파생한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안 지사의 말엔 분노가 담겨 있지 않다”(정)→안 지사의 “지도자의 분노는 피바람을 일으킨다”(반)→문 전 대표의 “지금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이다”(합)로 완성된 변증법은 선순환의 측면을 보여 준다. 두 주자의 변증법적 충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윤리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인간이 미워서 또는 아스팔트를 피로 덮기 위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숭고한 분노로 그 분노의 대상까지도 감화시키기 위해 분노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carlos@seoul.co.kr
2017-02-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