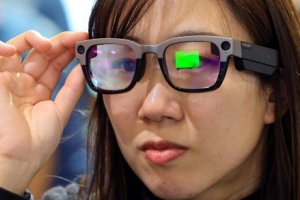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에 비해 440원 올랐지만, 인상률은 7.3%로 올해의 8.1%보다 하락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 이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당시 노동자위원 9명은 전원 퇴장했고, 양대 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브렉시트와 구조조정의 악재를 감안하면 그마저도 ‘고율 인상’이라는 재계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16년 기준으로 13.7%로, 7명 가운데 1명꼴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한참 기울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노동은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은 위기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구조적 처방이나 대안 없이 그저 노동이란 글자에 ‘개혁’을 덧붙인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리는 만무하다. 김영란법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이런저런 현실 때문에 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선뜻 와닿지 않는 까닭이다. 오랜 기득권, 그 기득권과 맞물린 음성적인 일상의 패턴, 청탁의 습성에 기인한 거부감의 발로일 수 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에는 인색하면서도 접대와 뒷거래의 묵은 관행에서는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면 박수라도 받았을 테다. 최저임금에서 위태롭게 턱걸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새벽부터 인력시장과 고시원, 도서관을 떠도는 실업자들,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안타까운 청년 취준생들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감도 설득력도 얻기 어렵다. 공동체의 조화로운 존속을 바란다면, 지향해야 할 가치에 현실을 맞춰 나가야지 현실에 가치를 꿰맞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반칙 없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공존·공생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과 같다. 그래야 패자부활전이 의미가 있고 시름 깊은 퇴직자의 골목 상권에 흥이 돋아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그 과정에서 작은 촉매제가 되리라 본다.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과실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틀을 쌓아 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전환의 계곡’을 맴돌더라도 언젠가는 산봉우리에 함께 올라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분담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정의(正義)를 얘기할 수 있다. 김영란법 완화를 말하기 전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부터 마련함이 옳은 이유다.
ckpark@seoul.co.kr
2016-08-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