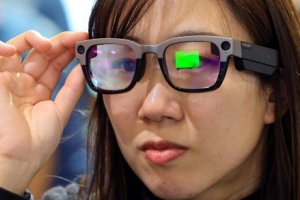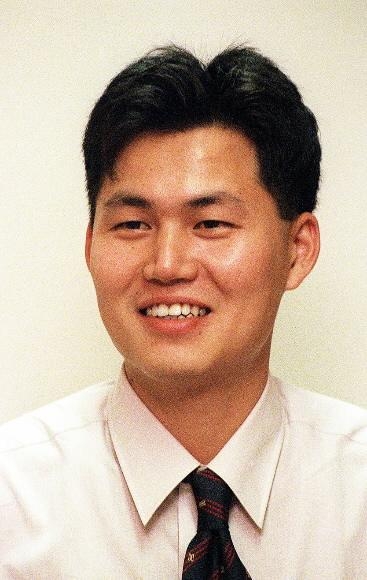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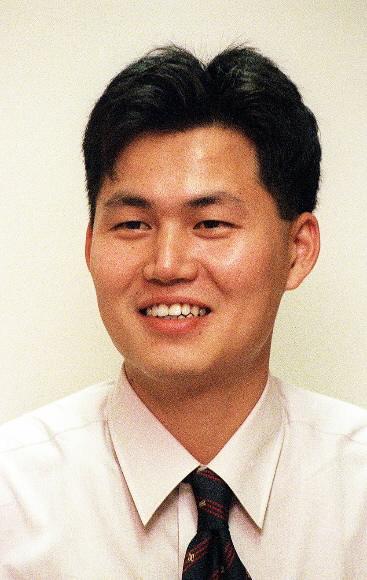
이지운 정치부 차장
TV가 날마다 ‘인간 승리’의 현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인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됐다. 뒤이은 장애인올림픽은 그 절정이었다. 각국 선수들의 의지와 투혼이 류샹의 기권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비난은 물밑으로 커져 갔고 루머도 빠르게 정설로 굳어져 갔다. ‘기권은 류샹의 뜻이 아니었다. 그가 컨디션을 최상까지 끌어올리지 못하자 금메달을 놓칠 것을 두려워한 고위층들이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게 루머의 주된 내용이다. 류샹은 당시 중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기 때문에 ‘100년 만의 꿈’, ‘중국 굴기의 현장’에서 중국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국가 지도부의 체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기권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믿고 있었다.
편지는 민심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다. ‘잘못 부쳐진 편지’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됐다. 이 일이 중국 당국의 민심 관련 주요 회의에 안건으로 올랐으며, 편지가 생산되기까지 보고 선상에 있었던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가체육총국의 책임론이 상당했다.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만, 특히 중국 지도부가 민정(民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중국으로서는 애초부터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바로 조용히 날아갔으면 가장 좋았을 뻔했다. 미국과의 ‘간단한’ 대화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중단시키는 실력을 발휘했다. 그럴 것 같으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을 찾아가 한국과 한국민에게 윽박지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중국이 이 윽박의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뒤이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5년 만에 방한해 5일이나 머물면서 줄줄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곳저곳 찾아다닌 것을 보면 ‘달래기’의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윽박을 지른 것은 추 대사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그를 만나 본 이들의 일치된 견해다. “성정상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들 입을 모은다.
중국은 대국인 만큼 주변국의 민정도 살펴봐야 하고 그럴 때가 됐다. 그게 중국이 부러워하는 ‘소프트 외교’의 핵심이기도 하다. 윽박은 외교관끼리, 관료끼리면 족하다. 언제까지 이웃 나라 국민을 향해 윽박을 질러 댈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국은 이번 윽박지르기의 전 과정도 점검해 볼 만하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세계로 난 주요한 창’이다. 중국의 습관성 윽박에 우리도 마냥 과민 반응할 일은 아니다. 그들도 실수를 한다.
jj@seoul.co.kr
2016-03-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