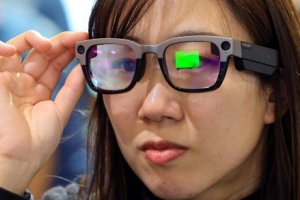김상연 정치부 차장
이 저주받은 지긋지긋함의 시초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승리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4월 26일 공기 맑은 설악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152명의 워크숍이 이후 10년 넘게 분열과 통합의 반복이라는 시지프스적 굴레의 발원지가 될 줄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참석자들은 예견치 못했을 것이다. 탄핵 역풍으로 대거 국회에 입성 또는 재입성한 ‘개혁파’(급진파)들은 워크숍에서 시종 기세등등했다. 기성 정치를 조소하듯 유시민 당선자는 야구모자를 쓰고 워크숍에 나타났고, 정청래 당선자는 기자들 면전에서 의정활동의 목표가 ‘족벌언론’과의 일전이라고 내질렀다. 이들 개혁파는 당시 정동영 의장(대표)을 비롯한 ‘실용파’(온건파)와 당의 노선 설정을 놓고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개개인에게 이념은 종교와도 같은 것이어서 서로는 좀처럼 설득되지 않았고,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만 탈진시킨 채 토론은 어정쩡하게 종결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야당의 변천사는 설악산 워크숍의 확대·재생산·연장전·재방송 버전이다. 수차례 당이 쪼개졌다 합쳐졌다를 반복하고, 간판에 ‘민주’니 ‘통합’이니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거듭하는 등 온갖 변신술에 성형수술을 다 동원한 뒤 마주한 거울에는 허무하게도 10여년 전 그대로 ‘개혁파(친노) 대 실용파(비노)’의 충돌이 서 있다. 이 둘은 이념의 문제여서, 즉 물과 기름 같은 것이어서 애초에 화학적으로 섞이는 게 불가능했다. 섞일 수 없는 것들을 섞으려고 하다가 야당은 너무 상처를 받았고 희화화됐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야당 지지자들은 “제발 분열하지 말고 통합해라”라는 호소가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하루 종일 젓가락을 휘젓는 것만큼 허망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이 성급했네, 어쩌네 하는 것은 부질 없다는 얘기다.
이 지긋지긋한 시지프스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 설악산 워크숍의 재방송을 영구 종영하고, 타협을 통한 단일화니 통합이니 하는 미망과 단호히 절연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끼리 당 대 당으로서 우열을 가려 깨끗하게 승부를 보자는 얘기다.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합을 이루는 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지지자들도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냉혹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야당끼리 눈앞의 당선을 위해 어정쩡하게 단일화나 통합을 타협하면 결국은 다시 지긋지긋한 노선 투쟁을 일삼다가 지긋지긋한 사퇴 요구와 지긋지긋한 버티기 끝에 지긋지긋한 탈당과 지긋지긋한 분당을 거쳐 다시 지긋지긋한 통합을 하고 그래서 또 좀 먹고살 만해지면 지긋지긋한 노선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carlos@seoul.co.kr
2015-12-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