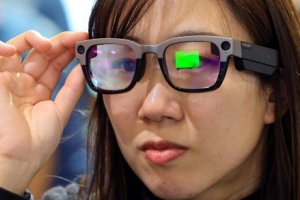이종락 논설위원
애플의 이런 수리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애플은 국내에 애플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거리의 애플 제품 전문점은 ‘리셀러’라는 이름의 판매점이고, AS센터도 애플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대행할 뿐이다. 수리도 사용자의 핸드폰을 반납하고 리퍼폰(동일한 제품의 수리된 폰)을 받는 리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애플이 불편하고 복잡한 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애플이 핸드폰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여러 회사에 부품 제작을 의뢰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회사가 수리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수리점도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이 이르면 2019년에 전기차를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개발과 설계만 맡고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레퍼런스’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런 방식은 생산설비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법적 규제와 관련한 문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전기차 자체가 충전 인프라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느냐는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애플은 경쟁력이 전혀 없다. 전기차 부문에서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아 왔던 미국의 테슬러가 최근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애플의 전기차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밥 러츠 전 GM 부회장은 최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자동차 사업 경험도 없고 경쟁사에 대한 장점도 없어 결국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데 그치고 말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러츠 전 부회장은 “내가 애플 주주라면 전기차 프로젝트에 대해 무척 화가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의 전망도 러츠 전 부회장의 견해와 그리 다르지 않다. 휘발유 자동차의 부품은 3만여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만 5000여개 정도에 이른다. 요즘은 자동차에 각종 전자 장치가 많이 들어가면서 부품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가 기계·전자 산업의 종합 예술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휴대전화 단말기 충전 단자조차도 직영 지점에서 신속히 수리하지 못하는 애플이 3만여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를 관리한다는 데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애플의 전기차 생산에 1997년 외환위기로 파산했던 삼성자동차의 악몽이 오버랩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jrlee@seoul.co.kr
2015-09-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