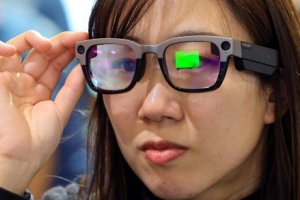한준규 사회2부 차장
지난해만 해도 ‘일’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던 서울시 간부 A씨는 요즘 근무 의욕이 뚝 떨어졌다.
그를 이렇게 만든 건 서울시 인사의 동맥경화 때문이다. 사실 모든 조직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특히 서울시는 심각하다. 전문가 경영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에 따라 이미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수장을 외부인이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들어 본청의 3급 이상도 세 자리나 외부인 전문가들이 차지했다. 1급 관리관 자리인 경제진흥실장과 3급 부이사관 자리인 혁신기획관, 문화체육정책관 등이다. 서울시 본청의 3급 자리 중 모두 6자리를 외부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언뜻 생각하면 공직개방 등 시대 흐름에 맞춘 박 시장의 선택에 고개가 끄떡여진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 공무원의 자존심과 성취감은 ‘승진’에서 비롯된다. 승진의 기회가 확 줄면서 그야말로 시키는 일만 하는 ‘머슴’ 같은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3급 승진 희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컸다. 이번 주에 있을 승진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 승진은 겨우 네 자리뿐이다. 4급 서기관은 18자리쯤 되는데 말이다. 평균 4급 승진의 절반 정도가 3급 승진을 했던 예년과 사뭇 다르다. B간부는 “보직의 꽃인 3급 국장 자리를 외부인으로 채우니 승진이 힘들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이로 인한 조직의 사기 저하와 무기력화 등이 곧 업무 차질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도 3급 승진을 포기했다고 한다. 대신 업무도 이젠 1등이 아니라 중간만 하겠다고 속내를 비쳤다.
서울시향의 박현정 대표로 인한 폐해도 서울시 조직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외부인으로 공직 개혁을 이룬다는 박 시장의 철학이 여기저기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굴러 온 돌은 2~3년 뒤에 훈장을 달고 다른 기관으로 떠나지만,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본인들이란 인식 때문이다. “높은 자리를 꿰찬 외부인들은 박 시장에게 뭔가 한 방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서 “그들에겐 시민은 없고 시장만 있다”고 C간부는 꼬집었다.
시민보다 시장을 위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책임은 남은 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들이 외부 고위직의 지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빛둥둥섬이 그랬고,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등 이미 반복된 경험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그들만 비난할 수는 없다.
지금 와서 던진 돌을 되돌릴 순 없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외부 전문가에게 거는 무조건적인 기대는 없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업무 실적을 명확한 잣대로 평가하고 공개해야만 모든 조직원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박 시장이나 모든 조직의 수장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라는 지적보다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 집안의 가장이 희망을 품고 일할 때 자녀가 행복해하듯이 서울시 모든 직원이 희망을 품고 일해야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곱씹어 볼 때다.
hihi@seoul.co.kr
2014-12-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