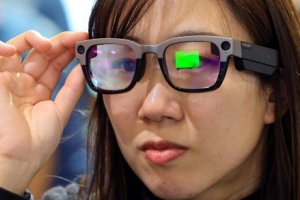김성수 산업부장
SK텔레콤이 ‘3·20 통신대란’을 일으킨 다음 날인 지난 21일 새벽까지도 기자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먹통’이었다. 일주일에 세 번, 오전 6시 40분에 필리핀에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10분간 영어수업을 하는데, 이날은 6시 50분이 되도록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한 번도 없던 일이라, 혹시나 해서 집 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수화기를 놓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왔다. 필리핀 여성강사였다. 5번이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서 고민 끝에 집으로 전화했다고 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부재중 전화’ 표시는 한 건도 없이 깨끗했다.
노트북으로 검색해 보니 21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통화가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SK텔레콤에 다시 문의를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결국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전화가 안 된다는 항의가 있었다”고 뒤늦은 실토를 했다
이날 기자처럼 전화영어가 한 번 ‘펑크’난 건 피해 축에도 못 든다. 한 트위터엔 “중국 바이어와 통화를 하다 전화가 끊겨 1300만원짜리 계약을 날렸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는 울분에 찬 글도 떠 있다. 콜을 못 받아 하루 일당을 날린 대리기사하는 분들, 전화 주문을 받을 수 없어 공쳤던 택배일 하는 분들을 비롯해 ‘전화먹통’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들의 ‘기회비용’도 당연히 SK텔레콤이 물어줘야 할 몫이지만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한 달치 요금에서 몇 천원 깎아줘서 될 일은 아닌 듯하다.
SK텔레콤은 이번에 1위 사업자답지 않았다. 사고발생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는 더 엉망이었다. 처음엔 24분 만에 복구했다고 발뺌하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당일 밤 11시 40분까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더구나 5시간 동안은 고객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입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다음 날에서야 사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통신대란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SK텔레콤은 데이터 장애 사고를 냈다. 통신회사가 기본 중에 기본인 설비투자에는 인색하고, 다른 회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한 ‘보조금 전쟁’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SK텔레콤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30년 동안 매출이 17조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이 2조원 넘는 ‘거대공룡’으로 성장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자이며, 시장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1등 사업자라면, 홈페이지에 써 놓은 ‘고객중심의 경영’이라는 약속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출기업과 달리 오롯이 국내 고객들의 주머니돈으로만 커 온 회사라면 특히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sskim@seoul.co.kr
2014-03-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