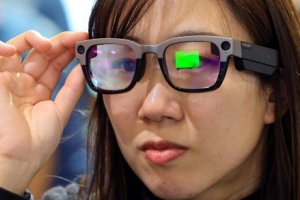송한수 부국장 겸 사회2부장
얘기는 옛 단체장과 얽혔다. 내가 먼저 불쑥 내뱉었다. “A시장, 참 아쉬운 분이죠.” 간부 B가 소주잔을 비우고 나서 말을 받았다. “그럼요, 갈 길이 바빴는데.”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사람을 잘 못썼어요.” 나도 머쓱해 다시 물었다. “아하, 무슨 일이 있었군요.”
B는 목청을 높였다. 2011년 어느 날이었다. 한창 회의할 무렵이다. 이른바 ‘정부미’뿐 아니라 교수 등 외부인도 끼었다.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공직자 C가 받았다. “×× 오빠한테 말하면 돼요.” 헉, B는 까무라칠 뻔했다. ××는 A시장 이름이다. C는 바깥에서 기용됐다. 꽤 높은 직위라 시장 최측근으로 불렸다. B는 “그런 C와 한솥밥을 먹었으니…”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측근이란 무엇인가.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다. 사실 ‘제대로’가 생략된 것이다. 측근 제1덕목은 이렇다. 복심(腹心)을 헤아려야 한다. 외려 윗분을 앞세워 득을 보려고 들면 여러모로 골치다. 호가호위(狐假虎威)가 제일 나쁘다. 교수들이 C를 어떻게 봤을까.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을 터. 공익은 안중에 없고 저만 챙기기 때문이다. 화(禍)는 단체장까지 미친다. 사람 볼 줄을 모른 죄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체장이라면 작든 크든 조직의 지도자다. 국민 삶과 맞닿지 않았는가. 사회적 파장이 큰 까닭이다. C는 ‘트로이 목마’에 버금간다.
선거로 분위기가 뜨겁다. 더러는 권력자를 팔기도 한다. 측근이라고 내세우는 꼴이다. ‘힘있는 여권 후보’란 구호도 똑같다. 다른 힘을 빌리는 데서 그렇다. 더욱이 당선으로 끝이 아니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문제다. 만고에 불변하는 진리다.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면 끝내 윗사람을 욕먹인다. 더 큰일을 그르치는 게다. 사람을 제대로 쓸 일이다. 앞선 사례가 잘 말해준다.
몇 해 전으로 되돌아간다. D대변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니, 꼬집은 셈이다. 못된 근성이 발동하고 말았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눈만 휘둥그레 떴다. 대답하기 궁색할 만하다. 나는 또 들입다 쏘아붙였다. “수장(首長)에게 바른말을 하세요.” D는 손사래를 쳤다. “어떻게 ‘아니오’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바른길로 이끌어야 옳다. 그에게 농담을 툭 건넸다. “혹 무늬만 대변인 아닙니까.” 대답이 걸작이다. “이왕이면 ‘무늬도 대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를 농담으로 넘겨야 할까.
D 역시 수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출입처마다 느낀 게 있다. 그릇된 측근 옆에 맹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끝내 모두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 취재 현장에선 늘 배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덕분이다. 최근 식사하는 자리에서 E고위공무원은 말했다. “권력을 조심 또 조심해야죠.” 부처 차관까지 거친 E다. 그는 또 두어 마디 보탰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칼 아닌 칼날을 잡고도 말이죠.” “딴 사람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귀담아들을 이야기였다. 경청도 측근의 덕목이다. 판단 잣대로 작용한다. 그래야 수장을 제대로 모신다. 칼날을 잡지 않게 돕는다. C, D와 함께 만났더라면 좋았겠다 싶었다.
측근의 바탕은 올곧은 마음 씀씀이에 있다. 이를 성심(誠心)이라고 한다. 진짜 측근은 스스로 측근이라 부르지 않는다.
onekor@seoul.co.kr
2014-03-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